【돈의 인문학】 김찬호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설날 뒤끝이다. 아이들이 가장 풍요롭게 흥청거리는 때다. 연 2조원에 이른다는 풍성한 세뱃돈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때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두둑한 주머니를 앞세워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등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한다. 부모들은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소비를 통한 잠시의 일탈을 만끽하도록 허용한다. 굳이 설날이 아니라도 평소 제대로 돌보고 대화 나누지 못하는 미안함을 돈으로 보상하곤 한다. 전통사회에서 부모의 농사를 돕고, 소 여물 베며 노동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던 아이들은, 현대사회에서 철저히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선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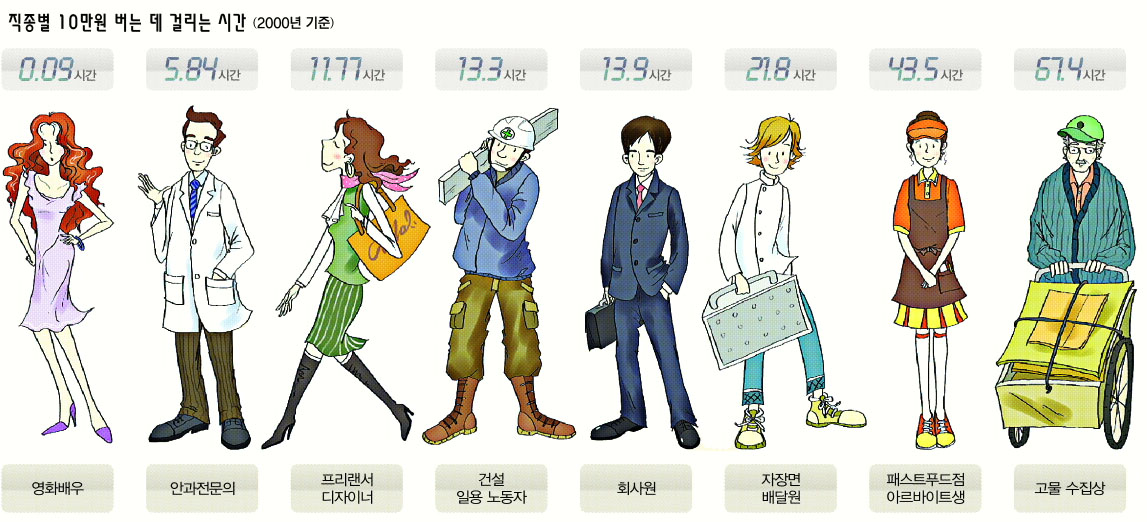

이런 풍경도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해 무고한 민간인 50여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 보상금은 가족당 200달러였다. 9·11테러 희생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6800분의1에 불과하다.
가까운 예도 있다. 회사가 보너스를 줬다. 아싸! 그런데 동료들은 100만원을 받았는데, 나만 90만원을 받았다. 기분이 심히 울적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떤가. 동료들은 모두 70만원을 받았는데, 나만 80만원을 받았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른다.
이렇듯 우리네 삶은 쉼 없이 돈을 욕망하고, 돈에 상처받고, 돈과 관계를 맺고, 많은 가치들을 돈으로 환산한다. 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돈의 인문학’(김찬호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돈의 실체에 둘러 쳐진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낸다.
부자되는 법, 대박 터뜨리는 법 등을 다루는 재테크 책이 난무하고, 책과 신문, TV, 그리고 퇴근 뒤 술자리에서도 돈에 대한 궁상과 허세가 함께 떠들어진다. 그러나 정작 돈이 나에게 무엇인지는 얘기되지 않고 있다. ‘돈은 최상의 하인이고, 최악의 주인’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포리즘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없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우리 속담만 상기해도 돈이 갖고 있는 양면성은 명확하다. 정승처럼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개처럼 버는 법만 부지런히 좇는 시대이니 더욱 그러하다.
‘거리의 인문학자’로 통하며 강단 안팎을 오가면서 강의하는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는 눈 부릅뜬 채 인문학과 사회학의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 돈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인문학적 접근을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이론을 앞세우지 않는다. 재미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누구나 삶 속에서 쉽게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돌돈-크고 무거울수록 가치가 높았다-을 썼던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캐롤라인 군도 야프 섬 사람들 이야기, 농담이나 불법, 사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달의 토지를 분양해 떼돈을 번 미국 남자 이야기, 영화와 시, 소설이 곳곳에서 적절하게 불쑥불쑥 등장한다.
그는 “인문학적 사유가 지금 닥친 금전적 어려움에 직접적 해결책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찰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더욱 무기력하게 돈의 위력에 휩쓸리고 빨려들게 된다.”면서 “인문학은 돈과의 관계를 리모델링하는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책에서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 자녀(혹은 남)에게 돈 이외에 주고 있는,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자녀(혹은 남)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며 결론짓는다. 당신의 삶에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1만 3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2-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