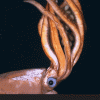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머지않아 돌담으로 둘러친 술청 거리가 나타났다. 명색 색주가라 하지만, 돌담 일색이었다. 돌담은 바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각종 약초 따위가 돌 틈에서 움트기 때문이다. 4월이 되면 그 돌 틈에서 제비꽃*이 움을 튼다. 제비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개미집이 있는데, 제비꽃을 개미들이 번식해 주기 때문이다. 제비꽃 뿌리를 찧어 화농된 상처에 바르고 명주로 싸매주면 증상이 멎는다. 저녁 거미가 내려온 터라, 술청 거리는 벌써 나름대로 분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색주가 돌담에 기대 세운 장대 위의 용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술청마다 등불을 밝혀서 창자가 출출하거나 타향길에 고단한 길손들의 가슴속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여름날이면, 마당에 내다 놓은 살평상에 논다니나 들병이들이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호객도 삼가지 않았지만, 추운 겨울에는 얼어죽을까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빈 봉노에 불만 희미하게 밝혀두었다.“주모오.”


“주모오?”
그제야 정주간으로 난 바라지 문을 살짝 열고 주모가 삐쭘 얼굴을 내밀었다. 주모는 윤기호를 알아보자 냉큼 영색을 짓고 정주간으로 나섰으나 행동거지가 평소처럼 날렵하지 않고 굼떴다. 게다가 봉노에서 술추렴하던 패거리들에게 거웃을 내주고 시시덕거리던 중이었는지 고쟁이 속곳 차림에 맨발이었다. 들병이 둘을 두었는데, 그 논다니들 역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술청에는 너댓 되는 장정 패거리들이 두루거리 술상에 난삽하게 둘러앉아 술추렴들 하고 있었는데, 밖에 서 있는 일행들을 힐끗힐끗 눈짓해가며 주거니 받거니 곤댓짓을 하면서 떠들었다. 단골집을 찾아왔는데도 예상치 못했던 홀대를 당하자, 적잖이 배알이 뒤틀렸던 윤기호는 주모에게 심사 뒤틀린 눈길을 보내며 볼멘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굴러온 패거리들인가?”
공술을 주는 대로 받아마셔 취기가 도도한 주모가 게트림 길게 빼고 난 다음 시큰둥하게 대꾸를 건넸다.
“그야 모르지요. 어디 굴러온 개뼈다귀들인지.”
단골인데도 주모의 언행이 느닷없이 상되고 퉁명스러운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윤기호는 소금 도가 포주인으로서 내성 장시에서는 행세깨나 한다는 위인이었고, 그의 수결은 멀리 있는 고령이나 원산의 보부상들 사이에서도 거리낌없이 통용될 정도로 신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윤기호에게 주모가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문전박대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었다. 소금 상단 일행은 그 연유를 알아챌 수 없었다. 사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온 패거리인지 모르겠다는 주모의 말이 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정주간 바라지 문이 부서져라 버럭 열리면서 한 사내가 나보란 듯이 문 밖으로 썩 나섰다. 입성은 뜯다 만 꿩같이 스산했으나 눈은 얼음에 빠진 쇠 눈깔처럼 번들거리는 궐자가 다부지게 한마디 쏘아붙였다.
“염병에 까마귀 소리라더니, 어느 개자식이 찾아와 남의 속을 불쑥 질러?”
험악한 목자를 보자하니 대중없이 덧들였다간 장정 다리 하나쯤은 일같잖게 작신 분질러놓을 것 같았다. 얼떨결에 윤기호를 뒤따라온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일행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배고령이 옆에 선 길세만의 잔허리를 꾹 찌르며 속삭였다.
“냉큼 비켜나세.”
윤기호를 따라온 소금 상단 일행 중에는 결기 있는 곽개천이 끼어 있었다. 그는 열린 바라지 문 사이로 봉노 안의 풍경을 문득 엿보았다. 일견해서 행랑것이나 장물림들로 보이긴 했다. 그러나 같은 원상들이라면 이쪽에서 다소 범절에 어긋난 행동거지를 보였더라도 다짜고짜 욕지거리로 대거리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맨상투 바람인 그들 중에 댓개비로 만든 패랭이(平凉子)를 쓰고 있거나 이마에 패랭이를 쓴 자국을 가진 자도 없었다. 분명 원상들은 아니었다. 굴러온 뜨내기임은 분명했는데, 그 본색을 얼른 가늠하기 어려웠다. 곽개천은 그들의 속내를 떠보기로 하고 한마디 던졌다.
“큰소리로 주모를 찾은 우리들도 결례가 있었지만, 대뜸 험한 말로 대거리할 것은 아니지 않소.”
*제비꽃:오랑캐꽃
2013-05-1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