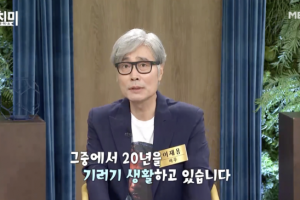허형만 여섯번째 시집 ‘그늘… ’
서울서 지내는 이라면 바닷가 항구도시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갈하고 과묵하게 시(詩) 쓰는 선비에게는 시의 서정을 다듬기에 그마저도 번잡스러웠나 보다.허형만(66) 시인이 내놓은 열세 번째 시집 ‘그늘이라는 말’(시안 펴냄)은 목포대 국문과 교수이면서 안식년을 틈타 구순 어미의 품으로, 지리산 산자락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어(詩語)로 풀어낸다.
시의 시선은 땅으로, 낮은 곳으로, 작은 것으로, 침묵으로 향한다. 39년째 접어든 시력(詩歷)이 궁극적으로 머무는 지점은 자기 자신이다.
시편 ‘절하다’에서 어머니가 밭에서 캐낸 ‘줄줄이 딸려 나와 세상을 밝히는/ 저 붉은 고구마’에게도 두손 모아 절하고, ‘우루루 쏟아지는’ 어머니의 독경 소리에도 절하는 시인의 섬김의 뜻이나, ‘야생의 바람을 껴안고 잠든 강을/ 이리 무심히 바라보고 있느니’(‘겨울 노래’ 중)라며 자연으로 침잠함은 한결같은 성찰의 몸짓이다.
지리산으로 들어선 이유 또한 시로 설명했다. ‘…들어서는 안될 소리 듣고 말았으니/…/아예 귀 자를 수밖에, 그래 자른 귀 염(殮)하여/ 솔바람소리 맑은 양지 바른 곳에 묻기 위해’(‘귀를 염하다’ 중)였다고 부끄러이 고백한다.
연작시 ‘산거’(山居)에 이르러서는 산중에 묻힌 여유로움과 기쁨,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정수가 느껴진다. ‘말 잊은 지 이미 오래’인지라 ‘졸참나무 숨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갓밝이 닭울녘/ 동녘 하늘로 아스라이 번지는/ 저 빛살 참 곰살갑다’고 소박하게 노래한다.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발문을 통해 “허형만 시인은 우리 시단의 세 흐름인 서정, 실험, 참여 가운데 서정의 적자로 꼽힌다.”면서 “이번 시집에서 선보인 서정의 간단 없는 심화는 자기 성찰과 타자 발견의 시학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고 평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1-2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