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한국 대표 문인들 동인지 폐간 후 창작공간 좁아져 식민지시대 유행가 18%나 불러
유성기의 시대, 유행시인의 탄생/구인모 지음/현실문화/584쪽/2만 8000원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문인들은 1929년부터 1937년까지 근 10년간 유행가 가사를 쓰고 음반으로 취입했다. 일제 강점기 문인들의 외도와 이탈을 문학사 및 문화사적으로 분석한 책 ‘유성기의 시대, 유행시인의 탄생’은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선언으로 출발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광수, 김억, 주요한, 김동환, 이은상, 홍사용 등이 노랫말을 쓰고 고한승, 김종한, 김형원, 노자영, 유도순, 이하윤, 조영출 등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시인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이 음반에 취입한 작품은 확인된 것만 698곡으로, 식민지 시대 전체 유행가요의 18%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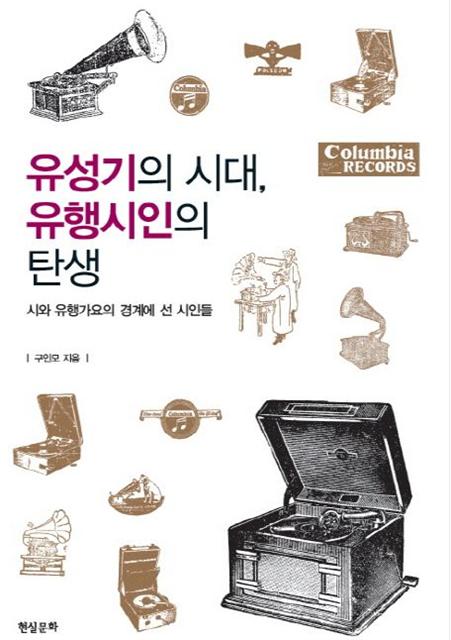

유행가요의 운명은 1932년 매일신보 기자가 이광수의 ‘쓰러진 젊은 꿈’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엽기적’이라고 한 데서 보듯 어느 정도 예견된다. 흘러왔다 흘러가는 유행가의 속성처럼 정통 문인들의 유행시는 곧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김억과 이하윤은 1937년 이후 전시상황에 부응하는 시국가요를 짓는 등 전쟁협력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기도 했다. 지은이는 그러나 “‘동심초’(김억 작사, 김성태 작곡), ‘동무생각’(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등이 가곡으로 남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임태순 선임기자 stslim@seoul.co.kr
2013-10-26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