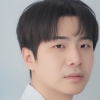한국전쟁의 참상 생생히 증언하는 ‘평화의 나무’
60년도 더 지났건만 이 땅에 전쟁이 남긴 상처는 채 씻어지지 않았다. 전쟁 발발일이 들어 있는 유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갖가지 요란한 행사를 치르지만, 평화를 향한 걸음걸이는 여전히 제자리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턱없는 이유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역사의 상흔은 안타깝게도 아직 아물지 않았다. 누구라도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그곳을 찾아가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가 이토록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내려놓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다. 앞으로 얼마나 더 먼 길을 걸어야 참 평화가 살아 있는 세상에 다다를 수 있을지 곰곰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다.

한국전쟁 최악의 비극적 참사를 똑똑히 지켜본 유일한 생명체인 대전 형무소터의 왕버들.
●좌익과 우익을 번갈아 학살한 현장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상처이기에 더 보듬어 안아야 해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를 생생히 보전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첫걸음 아니겠어요.”
풀뿌리여성 마을숲 공동대표 민양운(49)씨는 토요일이면 마을 중학생들과 함께 ‘평화의 나무’라는 입간판이 서 있는 나무 주변의 공터를 청소한다. 시민들 스스로 ‘평화공원’이라 이름 붙인 공터 주변이다. 그러나 ‘평화공원’은 이곳 대전 중촌동 주민들에게조차 낯선 이름이다.
평화공원이나 평화의 나무는 지역 행정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 ‘그루터기’라는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마을 역사 탐험대가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붙인 이름이다. 한켠에 전쟁 희생자 위령탑이 높지거니 솟아 있지만 공원이라 부르기에는 초라한 아파트 옆 공터다.
이 자리에서의 참혹한 비극은 일제 식민지 때부터 시작됐다. 1919년에 일제가 이 자리에 ‘대전 감옥’을 짓고,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한 게 그것이다. 이어 한국전쟁 때는 이곳에 수감됐던 좌익 인사들이 죄 없는 양민과 함께 남쪽의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됐다. 바로 18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산내 학살사건이다. 비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산내 학살사건 직후 대전 지역을 점령한 북쪽의 군인들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북으로 퇴각하면서 수감 중이던 우익 인사 학살로 앙갚음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을 짓밟은 최악의 비극이었다.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건만 당시의 흔적이라고는 한 개의 우물과 망루가 전부다. 그나마 다른 건물들 틈에 파묻혀 찾기도 쉽지 않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 이름 붙인 나무
“제대로 남은 게 없어요. 당시의 자취를 지켜야 했는데, 좀 늦었어요.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안타까워하던 중 찾게 된 것이 바로 이 나무였죠.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았던 살아 있는 생명체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지요.”
민씨는 마을 사람들과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지역에 남은 전쟁의 상처가 생각보다 우심하다는 걸 알았고, 이를 극복하는 게 곧 이 시대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옛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지만 다행히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을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나무를 ‘평화의 나무’로, 그 주변 지역을 ‘평화공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나무를 오래 지키기 위해 관계 기관에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는 청을 넣었으나,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정성껏 추렴하여 나무가 겪은 옛일을 기록한 안내판을 세웠다.
평화공원 왕버들은 키가 9m를 넘고, 사방으로 고르게 14m까지 나뭇가지를 펼쳤다. 가지마다 무성하게 피어 난 잎사귀의 싱그러움은 청년기 왕버들의 전형적인 건강함을 보여 준다. 비스듬히 올라온 중심 줄기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나무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에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값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 줄기가 잘 썩는 왕버들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여느 나무에 비해 자람이 빠른 왕버들이지만, 현재 나무 줄기의 상태와 전체적인 규모로 보아 대략 100세 정도로 보인다. 남아 있는 기록은 없지만, 일제가 대전 감옥을 짓고, 감옥 주변의 연못 가장자리에 풍치수로 심었던 여러 그루의 나무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평화는 밥 짓듯 스스로 조금씩 익혀 가는 것
대전 감옥 주변의 학살 참사를 고스란히 목격한 왕버들은 감옥도 연못도 심지어 나란히 서 있던 다른 나무들조차 모두 사라진 뒤에 홀로 남았다. 그야말로 폐허의 터에 욕처럼 살아남은 목숨이다. 옛 비극의 흔적을 갈아엎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번잡한 시장이 들어서며 모두가 잊으려 하는 기억을 홀로 붙들어 안고 서 있는 목숨이어서 더 치욕스럽다.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다.
“모든 비극을 고스란히 바라보았을 나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옛일을 잊으려고만 했지 묻지는 않아요. 이제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게 평화에 다가서는 길이에요.”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듯이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익혀 가는 것”이라고 덧붙인 민씨의 어깨 위에 ‘평화의 나무’ 가지에서 살랑이는 잎새의 초록 향기가 살풋 내려앉는다.


글 사진 대전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gohkh@solsup.com
▶가는 길 대전 중구 중촌동 16-11 자유회관. 경부고속국도의 대전나들목으로 나가서 2㎞ 남짓 직진하면 고가도로가 나온다. 고가도로를 이용해 다시 1.2㎞쯤 직진한다. 대전 시내를 흐르는 대전천을 건너자마자 우회전한다. 곧바로 나오는 대전중·고등학교를 끼고 좌회전해 450m쯤 간 뒤 우회전하면 곧바로 대전 선병원이 나오고, 그 맞은편의 자유회관 가장자리가 평화공원이다. 나무는 자유회관 마당 한켠에 있는데, 주변의 주차 사정이 좋지 않다. 도로변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2012-06-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