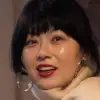재일 조선인 ‘조선적(籍)’을 아시나요
지난달 16일 북한과 브라질이 남아공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북한 대표팀의 정대세 선수가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정대세 못지 않게 눈부신 활약을 한 안영학 선수도 국내 K리그에서 활약해 우리에게 낯이 익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북한 팀에서 뛰었지만 국적은 달랐다. 안영학은 조선적(朝鮮籍), 정대세는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의 남다른 인생역정을 통해 60만 재일동포들의 국적문제를 되짚어 본다.
K리그 수원과 부산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올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던 안영학의 국적은 한국도 북한도 아니다. 법적으로 ‘조선적’인 안영학은 엄밀히 말해 무국적자다. 정대세도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조선적’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그때까지 내국인으로 간주하던 식민지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남북에서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1947년 일본은 외국인 등록령을 발효하면서 한반도 출신자로 일본에 남아있던 60여만명을 일률적으로 ‘조선’으로 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재일동포는 ‘조선’이라는 가상국가의 소속원일 수밖에 없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재일동포들은 조선에서 한국으로 국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을 택하는 것이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남북 어디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적’으로 남게 됐다. ‘조선적’은 외국여행에 제한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도 이들을 도와줄 대사관이 없는 등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안영학은 일본에서 출국할 때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재입국허가증을 취득한다. 북한대표팀으로 외국에 나갈 때는 북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갖고 간다. 한국에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갈 때도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다. 외국 공항에서 “왜 여권을 3개나 갖고 있느냐.”는 이유로 붙잡힌 적도 있다고 한다. 다행히 그는 K리그에서 뛸 당시 ‘북한과 재외동포는 국내선수로 취급한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약 덕분에 ‘외국인’ 용병 취급을 받진 않았다. 조선적 동포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여만명에 이르던 조선적은 최근 3만명 이하로 급감했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공식 인정한 뒤 조선적을 포기하고 대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정대세와 안영학이 재일동포 3세인 것에서 보듯 재일동포 사회는 3세와 4세가 중심이다.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례도 느는 등 존립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 한편에선 일본어로 재일동포를 가리키는 말인 ‘자이니치(在日)’로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삼는 재일동포들도 나타난다.
재일동포 3세로 스포츠전문 기고가인 신무광씨가 재일동포 축구선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선수’에서 안영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북이요, 남이요, 일본 등 나를 그 어디라고 규정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굳이 한다면 나는 ‘자이니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대세도 “내 모국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 속에 있는 ‘재일’이라는 또 다른 나라”라면서 “골을 통해 ‘재일’의 존재를 널리 알리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