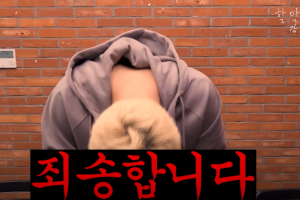‘배우자로 가능’ 미국인-조선족-일본인 순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에서 혈통을 중시하는 의식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배우자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늘어나 국제결혼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은 21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일환으로 작년 7-9월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5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03년 조사치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93.9%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국적을 갖는 것’(89.1%),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86.1%),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81.4%),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77.5%), ‘한국인 조상을 갖는 것’(64.6%),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63.6%) 등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를 4점 척도로 전환해 2003년 조사치와 비교한 결과,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에서 출생지, 한국인 조상, 평생 거주 개념 등 종족적 요인은 2003년 3.08점에서 지난해 2.97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후천적 요인인 제도 존중이나 소속감 등 시민적 요인은 3.25점에서 3.37점으로 높아졌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정기선 연구교육실장은 “순수 혈통에 근간을 둔 ‘진정한 한국사람’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다만, 2003년 31개국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는 종족 요인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 81.6%가 찬성해 2003년 70.4%보다 국적 부여에 더 개방적인 의식을 보였다.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도 배우자 국적별로 북한이탈주민 36.0%, 미국인 34.6%, 조선족 32.2%, 일본인 31.6%, 중국인(한족) 26.0%, 동남아시아인 25.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비슷한 내용의 조사 때 북한이탈주민(34.3%), 미국인(28.8%), 일본인(25.1%), 조선족(22.2%), 한족(16.3%), 동남아시아인(14.6%) 등의 응답률을 보인 데 비해 모두 높아진 것이지만, 특히 조선족이 일본인보다 응답률이 높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이주민의 경제적 영향으로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 찬성한 응답률이 2003년 52.9%에서 지난해 49.1%로 낮아졌고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23.1%에서 28.2%로 높아졌다.
또 이주민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과 관련해서는 54.4%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정 실장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일수록 한국인의 자격요건으로 종족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이민자를 경계 대상으로 여기고 외국인 근로자나 중국 동포의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아직은 이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은 만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