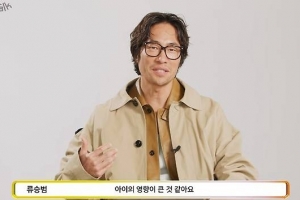20대로 보이는 처음 만난 남성이었다. 다짜고짜 “저 기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를 인터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취재 때문에 만난 자리도 아니었다. 직장인들의 공부 모임이었고 나도 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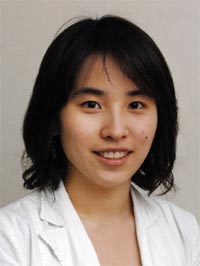
윤설영 정치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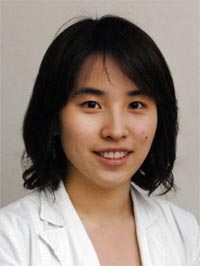 그냥 덤덤하게 “알았다.”며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처음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어 달 전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우연히 만났다.
그냥 덤덤하게 “알았다.”며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처음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어 달 전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우연히 만났다.
취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에서였다. 회원이 100만명이고 책도 몇 권 펴낸 사람이라고 했다. 한참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난 기자랑 말도 안 섞는데… 기자라고 왜 말 안 했느냐.”며 대뜸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에 도취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다.
기자가 칭찬받을 직업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내가 사회의 소금이 되는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언제나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난이 나에게 채찍질이 되기는커녕 마음속에 불쾌함만 남았다. 초면에 이런 무례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듯 나에게도 악플을 달려는 것 같았다. 한국사회는 인터넷에서 나쁜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주는 것을 정당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악플에 상처받았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공격성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것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들의 공통된 다음 질문은 어느 매체의 기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쉽게도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로부터 조언이나 건전한 비판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말이다.
snow0@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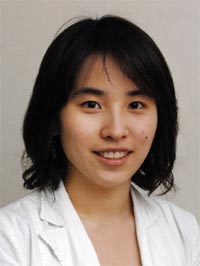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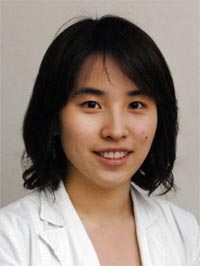
윤설영 정치부 기자
취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에서였다. 회원이 100만명이고 책도 몇 권 펴낸 사람이라고 했다. 한참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난 기자랑 말도 안 섞는데… 기자라고 왜 말 안 했느냐.”며 대뜸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에 도취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다.
기자가 칭찬받을 직업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내가 사회의 소금이 되는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언제나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난이 나에게 채찍질이 되기는커녕 마음속에 불쾌함만 남았다. 초면에 이런 무례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듯 나에게도 악플을 달려는 것 같았다. 한국사회는 인터넷에서 나쁜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주는 것을 정당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악플에 상처받았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공격성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것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들의 공통된 다음 질문은 어느 매체의 기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쉽게도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로부터 조언이나 건전한 비판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말이다.
snow0@seoul.co.kr
2010-07-24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