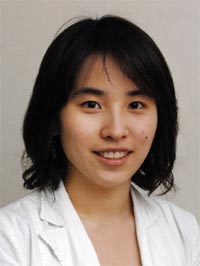
윤설영 정치부 기자
그런데 일본 언론의 보도 방식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닌 것 같다. 지진 발생 후 6일간 일본에 머물렀지만 기자는 피난소에 적절한 구호물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재해지역을 찾았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대신에 대피소에서 구호물자가 오기를 착하게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들의 모습만 봤다.
“방사능이 걱정되지 않느냐.”, “구호물자가 부족한데 힘들지 않으냐.”라는 식으로 기자들이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래봤자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정치인들의 위로 방문을 촉구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안부 확인, 교통·수도·전기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더 실용적인 뉴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정부는 왜 빠른 지원을 하지 않는지, 정치 지도자는 왜 현장지휘를 하지 않는지 신문 1면부터 사설까지 조목조목 비판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주민들에게 유익한지 않은지를 떠나, 분명 이는 정부를 움직이게 하고 시스템을 돌아가게 했을 것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 관행이 즉흥적이고 냄비처럼 잘 끓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일본의 보도 관행을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다. 국가 위기 상황 시 언론이 취해야 할 적절한 보도 스탠스는 어느 선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 계기였다.
snow0@seoul.co.kr
2011-03-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