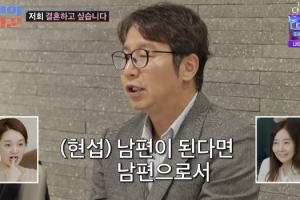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가로변 건물들이 비어 가는 것은 비단 오래된 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생 도시인 세종시의 큰 가로변은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급 과잉이다. 필요보다 많은 공간이 이미 공급됐는데 도시 개발을 계속하니 빈 공간이 늘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반 산업의 증가로 앞으로 도시에서 공간 수요는 계속 줄 것으로 보인다.
죽어 가는 도시를 살리겠다고 새로운 공간을 공급하는 것은 수분 과잉으로 죽어 가는 나무에 또 물을 주는 일과 같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도시재생, 청년공유공간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간의 입지나 수준은 차치하고 공급 자체가 잘못이다. 필자는 최근 몇몇 도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을 관찰했는데 한결같이 매우 한산했다. 도시를 살리기 위해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공간의 공급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타당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절한 위치에 있는 빈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활력을 잃은 도시를 살리려는 또 하나의 잘못된 처방은 ‘서울 따라 하기’다. 그것은 가로의 이름 붙이기에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모방의 대상이 명동이었으나 최근 경리단길로 바뀌었다. 수원의 행리단길, 부평의 평리단길, 양양의 양리단길, 전주의 객리단길, 경주의 황리단길, 부산 해운대의 해리단길…. 이런 서울 따라 하기는 지방 도시들의 가로를 특색 없는 길거리로 만들고 결국 도시 자체를 개성과 매력이 없는 그렇고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름 덕에 SNS에 오르내려 한때 관광객이 좀 모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도시를 살리는 것은 결국 주민이지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원조인 경리단길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그 많은 ‘○리단길’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리단길은 뜬 지 3, 4년 만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대명사가 되더니 지금은 거의 버려진 상태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조건에서 얻어지듯이 살기 좋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도 다른 도시와 다를 때 만들어진다. 서울에서 청계천 위 고가도로를 걷어 내니 필자가 사는 대전에서도 대전천 위 대형 건물들을 폭파시켰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다리인 목척교를 생뚱맞은 디자인으로 다시 놓았다. 그렇게 대전의 성격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 대신에 청계천 못지않게 훌륭한 대전천을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그 쾌적한 자연공간에 다가가도록 발길과 눈길을 터줬어야 했다.
최근 옛 충남도청 자리에 서울의 시민청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소식을 들으며 서울 따라 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도시마다 역사와 제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이든 어디든 다른 도시를 따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 세상에 다른 도시를 따라 하지 않아서 죽은 도시도, 따라 해서 살아난 도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9-08-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