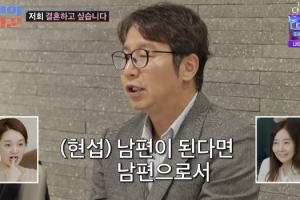누구든 자신이 하는 말이나 쓰는 글이 오해 없기를 바란다.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좀더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때로는 강조되기를 원한다. 말을 하고 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이런 심정과 태도가 깔린다. 그러다 어떤 장치들을 저절로 하게 되는데, 의도와 달라질 때가 있다.
“그는 곤란을 겪었다.” 이 문장 다음에는 흔히 “지원금이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형태가 온다. ‘왜 곤란을 겪었대?’에 대한 답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서술어로 ‘때문이다’를 많이 쓴다. 그렇다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지원금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쓰는 쪽도 있다. 이미 ‘왜’가 예상되는 맥락이라면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친절할 수 있다. 이때 ‘때문’은 괜한 친절이 되기도 한다. “그는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에서 ‘포부’도 실속 없는 친절일 때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면 지나친 게 된다. 표 나지 않게 부담과 갑갑함을 준다. 지루함, 거부감을 더할 수도 있다. 친절이라지만 과잉 친절은 군더더기다. 군더더기는 신뢰를 조금씩 떨어뜨린다. 일상의 일들이 그러하듯 문장에서도 그렇다.
wlee@seoul.co.kr
“그는 곤란을 겪었다.” 이 문장 다음에는 흔히 “지원금이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형태가 온다. ‘왜 곤란을 겪었대?’에 대한 답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서술어로 ‘때문이다’를 많이 쓴다. 그렇다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지원금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쓰는 쪽도 있다. 이미 ‘왜’가 예상되는 맥락이라면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친절할 수 있다. 이때 ‘때문’은 괜한 친절이 되기도 한다. “그는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에서 ‘포부’도 실속 없는 친절일 때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면 지나친 게 된다. 표 나지 않게 부담과 갑갑함을 준다. 지루함, 거부감을 더할 수도 있다. 친절이라지만 과잉 친절은 군더더기다. 군더더기는 신뢰를 조금씩 떨어뜨린다. 일상의 일들이 그러하듯 문장에서도 그렇다.
wlee@seoul.co.kr
2019-10-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