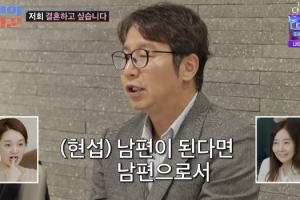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갓 귀국한 내게는 생소한 호칭이 의외로 많았다. 대학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실상 사라졌다. 다들 교수님이었다. 인문학 분야에서만 서로를 여전히 선생님이라 부르는 정도였다.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담당 의사를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으로 불렀다. ‘박프로’나 ‘정프로’라는 호칭도 처음 들을 때는 약간 당혹스러웠다. ‘김대표’라는 호칭도 생소했다. 그래도 김사장보다 김대표라는 호칭의 격이 더 높음을 간파하는 데 한 달 정도면 충분했다.
예전 호칭일지라도 사장님의 경우처럼 용례가 꽤 변해 있었다. 사장님 호칭은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점원의 전유물이 더이상 아니었다. 동네 가게 주인들도 으레 서로를 사장님으로 불렀다. 구멍가게 주인도, 철물점 주인아저씨도, 포장마차 주인도 사장님이었다. 자영업자는 모두 자타공인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사모님 호칭도 사실상 예전의 아줌마 호칭을 대신하고 있었다.
인간의 신분상승 욕구는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성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호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후기 때도 그랬다.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려는 욕구는 비(非)양반층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였다. 왕조의 통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욕구조차 변변히 표출하기 어려웠지만, 왕조가 흔들리던 18~19세기에는 호칭 인플레이션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의 표출이 봇물을 이루었다. 예전에는 양반만 사용할 수 있던 유학(幼學)이나 업유(業儒) 같은 호칭이 일반 양인 사이에서도 유행했다. 가선대부(종2품)니 통정대부(정3품)니 하는 품직도 납속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19세기 조선의 전체 인구 가운데 무려 70%가량이 양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류문명사에서 70%가 30%를 지배한 사례가 도대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어불성설이자 언어도단이다. 호칭상 양반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양반인 것은 아니었다. 각 지역의 전통 양반들이 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격조와 교양이 없으면 졸부로 비하하면서 진정한 부자의 축에 끼워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가 ‘사장님공화국’이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장님다운 경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다. 솔직히, 예전의 주인아저씨나 현재의 사장님이나 삶이 팍팍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래도 상대적 하위층이 호칭을 통해서라도 신분상승을 꾀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애잔하기까지 하다. 진짜 문제는 이미 잔뜩 가진 자들이 자행하는 의도적이고도 왜곡된 호칭 인플레이션이다. 검찰청의 수장은 마땅히 청장이어야 한다. 총장이라 부르면 좀더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나? 자격지심의 산물이 아니라면, 청장으로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19-10-2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