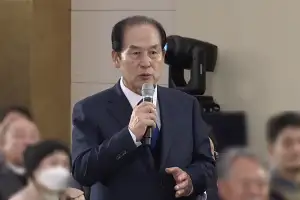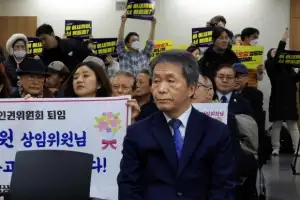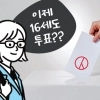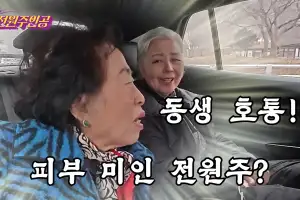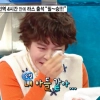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22일은 물론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도 훌쩍 넘길 조짐이다. 주요 대선공약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여야의 공방에다 ‘새 대통령 예산’으로 아예 3조~4조원을 떼어놓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까지 얹어지면서 예산안의 시한 내 타결이 벌써 요원해 보인다.
차기 정부 예산을 현 정부가 짜는 게 온당한지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에도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뒤 대선 결과를 반영해 예산안 조정작업을 벌인 뒤 12월 28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 청사진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집권 2년차는 돼야 한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선이 끝나고 며칠 안에 뚝딱 해치울 사안이 아닌 것이다.
여야의 행태가 더욱 딱한 것은 시급한 국책사업 예산은 뒤로 미뤄둔 채 앞다퉈 지역개발 예산만 챙기고 있는 점이다.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토건사업들을 대폭 줄이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의 실상은 이와 정반대다. 국회 국토해양위만 해도 지역별로 갖가지 토건사업들이 담긴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여원 늘려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예산도 고스란히 통과됐다. 대선을 틈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데다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지역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지역사업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토건사업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지경이다. 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9억원을 비롯해 주요 국책사업 예산은 여야의 공방 속에 발이 묶였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대책에 대해서는 대선의 득실을 따지며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예산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미국처럼 상시 예산심의가 가능한 체제가 아닌 이상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정책공약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정부안에 반영하는 선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차기 정부 예산을 현 정부가 짜는 게 온당한지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에도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뒤 대선 결과를 반영해 예산안 조정작업을 벌인 뒤 12월 28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 청사진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집권 2년차는 돼야 한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선이 끝나고 며칠 안에 뚝딱 해치울 사안이 아닌 것이다.
여야의 행태가 더욱 딱한 것은 시급한 국책사업 예산은 뒤로 미뤄둔 채 앞다퉈 지역개발 예산만 챙기고 있는 점이다.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토건사업들을 대폭 줄이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의 실상은 이와 정반대다. 국회 국토해양위만 해도 지역별로 갖가지 토건사업들이 담긴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여원 늘려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예산도 고스란히 통과됐다. 대선을 틈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데다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지역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지역사업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토건사업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지경이다. 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9억원을 비롯해 주요 국책사업 예산은 여야의 공방 속에 발이 묶였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대책에 대해서는 대선의 득실을 따지며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예산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미국처럼 상시 예산심의가 가능한 체제가 아닌 이상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정책공약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정부안에 반영하는 선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2-11-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