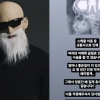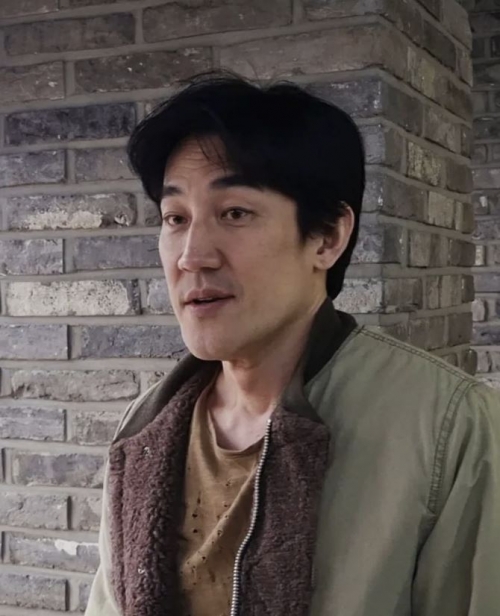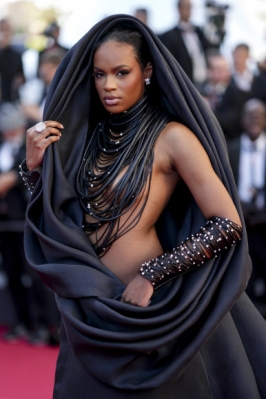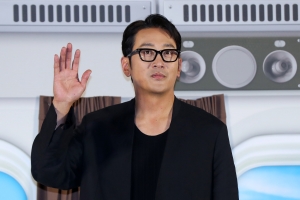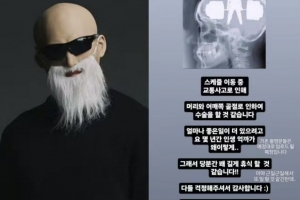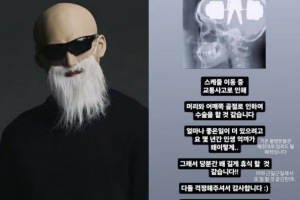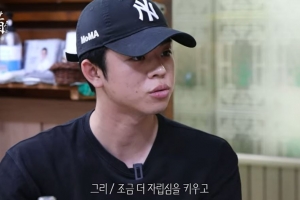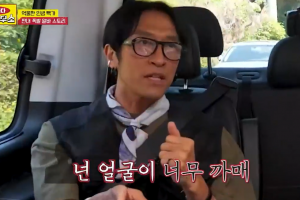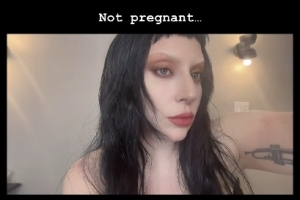조성규는 ‘맛있는 인생’에서 자기 생활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복제했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바에야 영화적 순간, 영화적 이야기를 창조해야 한다. ‘맛있는 인생’에는 그게 없다. 인물은 조성규가 사랑하는 도시인 강릉과 그 주변에서 먹고 노니는 여정을 되풀이하고 무리하게 따라붙은 곁다리 이야기가 무슨 멜로라도 되는 양 들려준다. 전자는 지루하고 후자는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벌거벗은 인물을 보면서도 진실함이 가슴에 닿지 않은 건 그래서였다. 조성규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영화를 만든 것처럼 보였다.
반면 ‘내가 고백을 하면...’은 평범한 일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색깔과 냄새와 박동을 포착한다. 자연스레 허구의 이야기를 힘들이지 않고 직조해 낸다. 감독의 삶에서 출발했으면서도 그와 떼 놓고 봐도 상관없는 이야기의 묘미를 선사한다. 서울에서 번잡하게 생활하는 영화인 인성은 머리를 식힐 겸 주말마다 강릉에 간다. 강릉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유정은 문화 생활을 누리고자 주말이면 서울로 향한다. 둘의 이야기인 ‘내가 고백을 하면...’은 일상에 발붙인 이야기 위로 담백한 로맨스를 얹어놓은 작품이다. 친구의 이야기를 갓 전해 들은 듯 이야기에 활력이 넘치고 소박한 숨결 속으로 착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무엇보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건 몇 번의 영화적 순간이다. 인성과 후배 작가가 유정의 아파트에서 각본 작업을 하다 실제 관계와 허구의 사랑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멀리 인성의 아파트에선 유정이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읽으며 아련히 속삭이는 사랑을 꿈꾼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자세로 잠든 모습을 차례로 바라보는 다음 장면의 행복감은 문학작품을 읽는 깊은 밤의 마법에 버금간다. 백석의 시처럼 눈이 ‘푹푹’ 내린 밤을 그린 엔딩은 또 어떠한가. 참 사랑스러운 영화다. 이 영화의 제목에는 점이 세 개 있다. 세 개의 점은 감독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닮았다. 망원경을 통해 세상을 구경하기보다 진심으로 터득했기에 가능한 발걸음이다.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