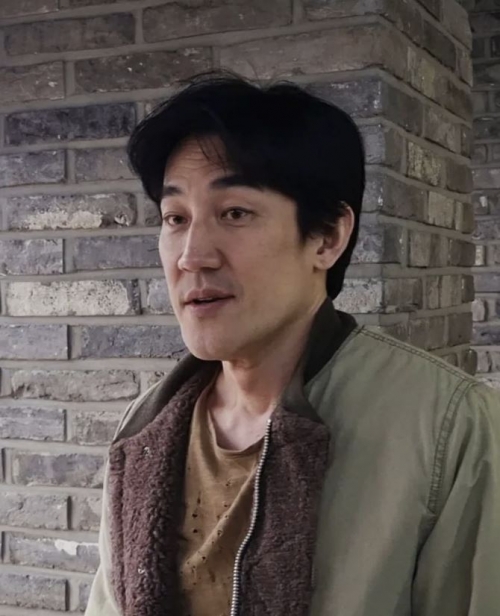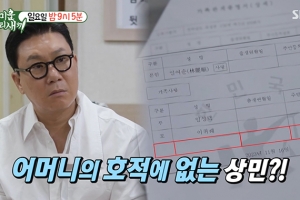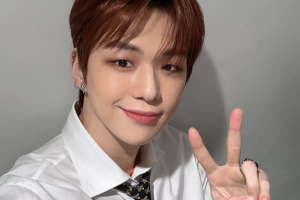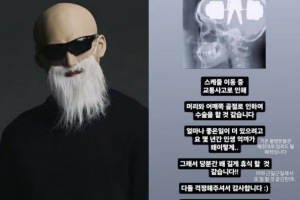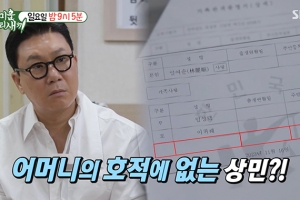연구소의 박사 윌리엄 데이먼(로렌스 피시번)은 처음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의 신호에 대해 의문을 갖고 추궁하지만 닉은 그의 조사를 거부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기계로 개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닉은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생체실험하고 있다는 음모를 알게 되고, 여자친구 헤일리와 연구소를 도망치려 하지만 길은 막혀 있다. 과연 그들이 빠져든 곳은 지구일까, 외계일까.
감독은 이에 대해 관객에게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 난해한 내용에 답답함을 느끼는 관객도 적지 않을 듯하다. 그 부분이 영화의 묘미이기도 한다. 감독은 관객들이 주인공들과 함께 끝까지 추리력을 발동하게 만들며, 모호한 분위기를 덧입혀 비현실적인 경험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뮤직비디오와 광고를 제작하다 2011년 SF 영화 ‘러브’로 데뷔한 윌리엄 유뱅크 감독은 감각적인 영상으로 기존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과는 다른 색깔의 ‘예술영화 같은 SF’를 선보였다. 물론 영화 전체가 실험적이고 불친절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UFO나 외계인에 관심 있는 관객이라면 흥미가 배가될 법하다. 특히 주인공들의 팔에 새겨진 ‘2, 3, 5, 41’이라는 숫자에 대해 UFO 전문가인 우석대 맹성렬 교수는 “이 숫자를 더하면 5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미국이 외계인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음모가 제기된 미국 네바다주 사막의 51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