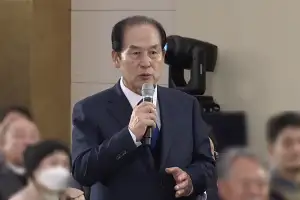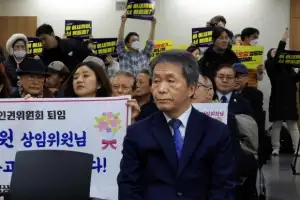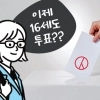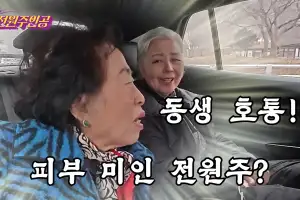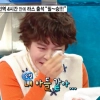한 병실서 재회한 두 원수 영리한 저예산 블랙코미디
민호(천호진·오른쪽)는 삶의 의욕을 잃은 중년의 우울증 환자다. 한적한 병원의 의료진에게 습관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는 골칫거리다. 어느 날, 기억을 상실한 남자 상업(유해진·왼쪽)이 민호와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상업을 보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린 민호는 어떻게든 살아서 복수를 완수하기로 마음먹는다. 문제는 두 남자의 신체 상태다. 민호의 신체 일부에는 마비가 와 있고, 상업은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전신마비 환자다. ‘죽이고 싶은’은 쌈박질을 벌이기엔 민망한 몸을 지닌 두 남자의 격한 다툼에 관한 영화다.
민호가 믿고 있던 진실이 의심받으면서 ‘죽이고 싶은’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한 놈이 상업이라고 여겼던 민호에게, 기억을 회복한 상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상업의 말에 의하면, 민호야말로 한 가족을 짓밟은 악당인 것이다. 민호에게 절망적인 얼굴과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은근히 동정심을 유발해 오던 영화는 갑자기 관객의 믿음을 배신한다. 관객의 믿음은 졸지에 시험대 위로 오른다. 지금껏 엉뚱한 사람의 말을 믿었단 말인가.
결말에 이르러 영화는 비틀거린다. 비밀과 반전에 대한 강박증 때문이다. 풀어놓은 걸 잘 담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두 감독(조원희·김상화)은 무리수를 뒀다. 개인의 복수가 끼어들자 과거의 죄는 풍부한 의미를 잃은 채 감상에 빠지고, 다소 환각적이고 초현실적인 처방은 현실의 문제들을 묻어 버린다.
특히 1984년의 시간을 야구 이야기와 반전거리로 소모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예를 들어, 임권택의 1980년 작품 ‘짝코’에서도 적대지간인 두 남자가 한 공간에서 재회한다. ‘짝코’가 역사와 개인을 다루는 방식에 비해, 근래에 등장한 한국영화들은 ‘죽이고 싶은’이나 ‘이끼’처럼 시간의 가치를 너무 빈약하게 인식하곤 한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죽이고 싶은’은 저예산영화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드러나는 작품이다. 영화적인 순간을 창조하지 못하는 단조로운 화면 구성과 조연 배우들의 딱딱한 연기가 눈에 거슬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근사한 아이디어와 거침없는 전개방식은 영화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 등장하는 두 주연배우, 천호진·유해진의 연기는 압권이다. 현재 다수의 영화인들이 개점휴업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죽이고 싶은’은 그러한 현실을 지혜롭게 돌파한 사례 중 하나다.
영화평론가
2010-08-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