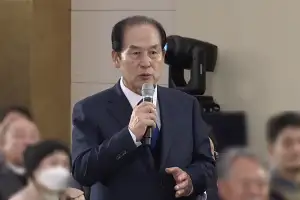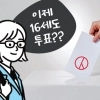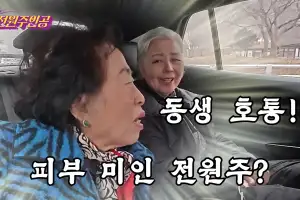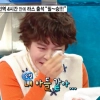제송희 한중연 연구원 ‘조선왕실의 가마 연구’
“중신으로서 늙고 병들어 말을 탈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사명이나 수령들은 가교를 일절 타지 못한다.”(승정원일기 1,425책 정조 2년 7월 22일)
논문 중 발췌
조선왕실의 이동수단 ’가교’의 모습
조선시대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던 ’가교’의 모습. 제송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지식정보센터 연구원은 21일 최근 논문 ’조선왕실의 가마 연구’에서 조선왕실의 탈것 문화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 규장학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계간지 ’한국문화’ 제70호에 실렸다.
논문 중 발췌
논문 중 발췌
예나 지금이나 ‘탈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는 가마는 함부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왕실에서도 왕이냐 왕비냐 왕세자냐에 따라 가마의 모양, 크기, 가마군의 수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
제송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지식정보센터 연구원은 21일 최근 논문 ‘조선왕실의 가마 연구’에서 조선왕실의 가마를 통해 상층 탈것 문화에 구현된 위계질서를 살폈다.
조선 초 왕실에서는 상아로 꾸민 수레인 ‘상로’를 사용했다. 이는 아직 공식 이동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식 탈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로는 세종대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상로를 폐지한 이유는 세종실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토지가 평평하고 넓으므로 장사에 유거(수레)를 쓰지마는, 본국은 도로가 험조하온데 역시 유거를 쓰는 것은 미편(불편)합니다. 이번 대행 왕비의 재궁(관)이 계행할(나아갈) 때에는 ‘가례’의 어깨에 매는 상여의 제조에 의해 정교하게 만드소서.”
이후 조선 왕실의 이동수단은 사람의 어깨에 가마를 메우는 ‘연’과 ‘지붕이 없는 ‘여’로 공식화됐다.
왕의 공식가마는 ‘대련’·’소련’·’소여’ 3종, 왕비는 ‘대련’·’소련’ 2종, 왕세자는 ‘연’ 1종이다.
대표적인 공식가마의 모양을 살펴보면 왕의 대련은 몸체부 4개의 원주(둥근기둥) 안쪽으로 2개씩 모두 8개의 방주(네모진 기둥)를 설치해 하늘과 땅의 결합, 음양의 조화, 삼라만상의 조화를 꾀하는 주재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난간은 주칠 위에 황금으로 바깥쪽에 운룡문(구름과 용 문양), 안쪽에 운봉문(구름과 봉황 문양)을 그렸고 위쪽 처마에는 화초, 아래 처마에는 수파련을 그렸다. 장강 아래로는 다시 난간을 설치하고 밑바닥에 판자를 깔았다.
왕비의 대련 역시 4개의 원주와 8개의 방주로 구성됐지만, 이중난간이 없고 난간에는 연꽃 위주의 수파련을 그린 것이 왕의 대련과의 차이다.
왕세자의 연은 4개의 기둥으로 돼 있고 크기는 조금 작았다. 장강(멜대)에는 검은 칠을 했다.
또 세자는 궐 내에서 걷는 것이 원칙이되 가례 때 빈을 친영하거나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 행차할 때만 광화문까지 걸어간 뒤 연을 타도록 했다.
그러나 중종 17년 나이 어린 세자의 건강을 염려해 궐 내에서 작은 교자를 타는 것이 허용됐다.
17세기는 왕실의 연여제도에 많은 변화가 인 시기다.
가장 큰 변화는 두 마리 말의 등에 장강을 메우고 앞뒤 좌우에서 가교군 8명이 장강을 누르거나 부축해 움직이는 ‘가교’가 생긴 것.
사람의 힘 대신 말에 의존하는 ‘가마’(駕馬)의 존재는 선조 연간부터 확인돼 광해군과 인조대를 거치며 점차 더 많이 이용됐다.
이 논문은 서울대 규장학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계간지 ‘한국문화’ 제70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