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ВІаВХўвгИВўѕ ВІю ВІгВѓгьЈЅ] ВІаьЋ┤Вџ▒ ВўцВЮђ в░ЋВЌ░Вц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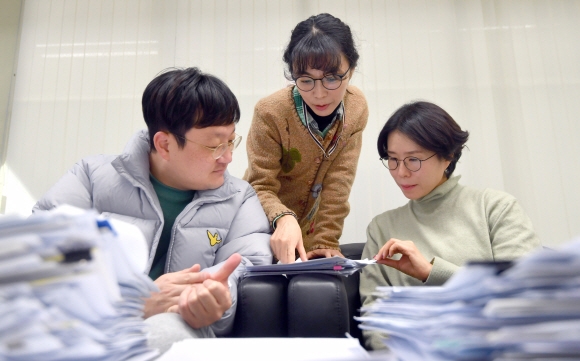
в░ЋВДђьЎў ЖИ░Въљ
ВІю вХђвгИВЮё ВІгВѓгьЋю ВўцВЮђ(ВЎ╝ВфйвХђьё░)┬иВІаьЋ┤Вџ▒┬ив░ЋВЌ░Вцђ ВІюВЮИ. ВѓгВДё В┤гВўЂВЮё ВюёьЋ┤ ВъаВІю вДѕВіцьЂгвЦ╝ в▓ЌВЌѕвІц.
в░ЋВДђьЎў ЖИ░Въљ
в░ЋВДђьЎў ЖИ░Въљ
РђўВўцьћѕРђЎВЮ┤ в│┤ВЌг Вцђ Ж░љВХцЖ│╝ вЊцьѓ┤ВЮў в»ИвЇЋ, Рђўвг╝Ж│╝ ьњђЖ│╝ Ж▒┤ВХЋВЮў ВІюРђЎВЌљВёю Ж░љВДђьЋю ВА░ВџЕьЋю ьЈГв░ю, Рђўв╣ёвІљьЋўВџ░ВіцРђЎЖ░ђ вДївЊцВќ┤ вѓИ в»ИвгўьЋю ЖИ┤ВъЦ, РђўВўевфИВЮ╝Вю╝ьѓцЖИ░РђЎЖ░ђ ВЮ╝Вю╝ьѓе ВюёьіИВЎђ вИћвъЎ ВюавеИВЌљ вїђьЋ┤ ВќИЖИЅьЋўВДђ ВЋіВЮё Вѕў ВЌєвІц. ьЋўвѓўЖ░ЎВЮ┤ веИвдгВЎђ Ж░ђВі┤ВЮё вЉљвЊювдгвіћ ВІюьјИВЮ┤ВЌѕвІц.
вІ╣ВёаВъЉЖ│╝ вЂЮЖ╣їВДђ Ж▓йьЋЕьЋю РђўВађЖИ░ Вађ ВъЉВЮђ вѓўвЮ╝РђЎ ВЎИ вёц ьјИВЮђ вЈЁьі╣ьЋю ВІюВаЂ ВёИЖ│ёЖ┤ђВю╝вАю ВІгВѓгВъљвЊцВЮў Ж│авЦИ ВДђВДђвЦ╝ в░ЏВЋўвІц. ВъљЖИ░вДїВЮў ВёИЖ│ёЖ░ђ ВЮ┤в»И ВЃЂвІ╣ вХђвХё ЖхгВХЋвЈ╝ ВъѕВќ┤ ВЋъВю╝вАю ЖиИ ВёИЖ│ёЖ░ђ Вќ┤вћћвАю Вќ┤вќ╗Ж▓ї в╗ЌВќ┤ вѓўЖ░ѕВДђ ЖХЂЖИѕьќѕвІц. ьєаВће ьЋўвѓўвЈё ьЌѕьѕгвБе ВѓгВџЕьЋўВДђ ВЋівіћ вгИВъЦвЊцВЮђ вгўьЋю вдгвЊгЖ░љВЮё ВъљВЋёвѓ┤ ВЮйВЮё вЋївДѕвІц ЖИ┤ВъЦьЋўВДђ ВЋіВЮё Вѕў ВЌєВЌѕвІц.
ВЌ┤вЮц ьєавАа вЂЮВЌљ Рђўв░ўвацВџИВЮїРђЎ ВЎИ вЉљ ьјИВЮё вІ╣ВёаВъЉВю╝вАю вйЉвіћвІц. ВаіВЮїВЮђ ВаіВЮђ ВЃЂьЃю, ьў╣ВЮђ ВаіВЮђ ЖИ░ваЦВЮё Ж░ђвдгьѓевІц. ВаіВЮђ ВІюЖ░ђ ВъѕвІцвЕ┤ ЖиИ ВЃЂьЃювЦ╝ ВъіЖ▒░вѓў ВъЃВДђ ВЋіЖ│аВъљ ЖИ░ваЦВЮё ВЈЪВЋёвХЊвіћ ВІюВЮ╝ Ж▓ЃВЮ┤вІц. РђўЖ│аьћћРђЎЖ│╝ РђўВЋёьћћРђЎВЮё ВЎИвЕ┤ьЋўВДђ ВЋівіћ ВІю, ВДѕвгИВЮё ЖиИВ╣ўВДђ ВЋівіћ ВІюВЮ╝ Ж▓ЃВЮ┤вІц. ВЮ╝ВЃЂВЮў ьЋю ВъЦвЕ┤ВЌљВёю ВДђвѓўЖ░ё ВІюЖ░ёВЮё ЖИИВќ┤ ВўгвдгЖ│а ВъЉЖИѕВЮў Ж░љВаЋВЮё ЖиИ ВюёВЌљ вѓ┤вацвєЊвіћ ВІюВЮ╝ Ж▓ЃВЮ┤вІц. Рђўв░ўвацВџИВЮїРђЎВЮђ ВЊ░вЕ┤Вёю Ж│аьїїВДђвіћ ВІю, в░░Ж░ђ в▒ЃЖ░ђВБйЖ│╝ в░░Ж╝йВЮё ВєїьЎўьЋўвіћ ВІю, вДѕВ╣евѓ┤ ВЈЪВЋёв▓ёвдгвЕ┤Вёю вЈЎВІюВЌљ ВЈЪВЋёВДђвіћ ВІюВўђвІц. Рђюв▓ёВЇЕЖ▒░вдгвіћРђЮ ВЮ╝ВЃЂВЮё в╣ёВДЉЖ│а вІцвЦИ ВА┤ВъгвЦ╝ ьќЦьЋю ВюаВЮ╝ьЋю Ж░љВаЋВЮ┤ ВєЪВЋёВўцвЦ┤вЕ░ в╣Џвѓўвіћ ВІюВўђвІц. ВџИВЮїВЮё Ж╗┤ВЋѕВю╝вЕ┤Вёю ВџИВЮїЖ│╝ ьЋеЖ╗ў Вѓ┤Ж▓авІцЖ│а вІцВДљьЋўвіћ ВІюВўђвІц.
ВІю ВЊ░віћ вЇ░ ВъѕВќ┤ ВЮ┤вЦИ ВІюЖ░ёЖ│╝ відВЮђ ВІюЖ░ёВЮђ ВА┤ВъгьЋўВДђ ВЋівіћвІц. ВІювЦ╝ ВЊ░віћ ВІюЖ░ёВЮђ вфевЉљ ВаюВІюЖ░ёВЮ┤вІц. вІ╣ВёаВъљВЌљЖ▓ї ВХЋьЋўвЦ╝, ВЮЉвфеВъљ вфевЉљВЌљЖ▓ї Ж│авДѕВЏђВЮё ВаёьЋювІц.
2022-01-03 37вЕ┤
Copyright РЊњ ВёюВџИВІавгИ All rights reserved. вг┤вІе ВаёВъг-Въгв░░ьЈг, AI ьЋЎВіх в░Ј ьЎюВџЕ ЖИѕВД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