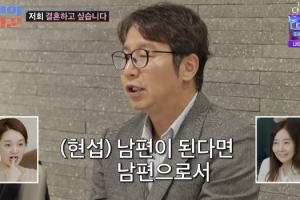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두얼굴’ 복지 지출 해법은
양극화 심화로 생긴 세계적인 ‘복지 광풍’은 두 얼굴을 보여줬다.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재정지출을 늘리고 근로 의욕을 낮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남유럽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유럽식 복지 모델에 대한 실망은 커졌고 기존 복지의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북유럽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복지의 두 축을 현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 딜레마에 빠진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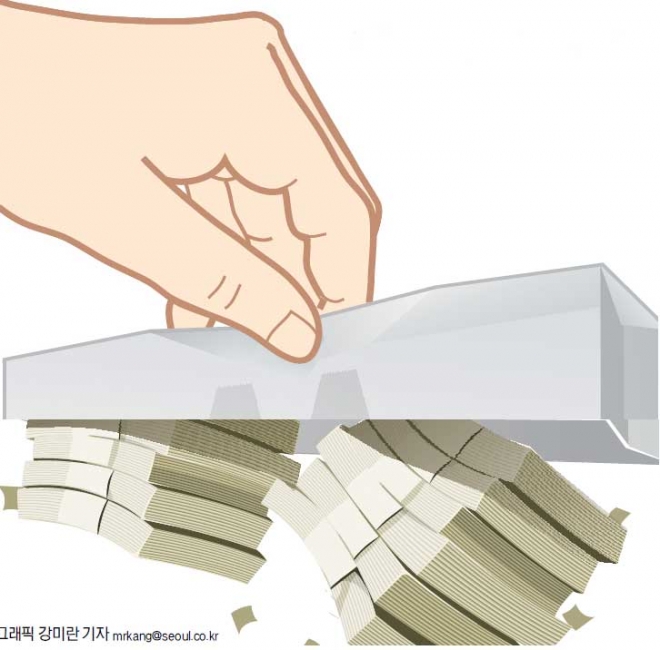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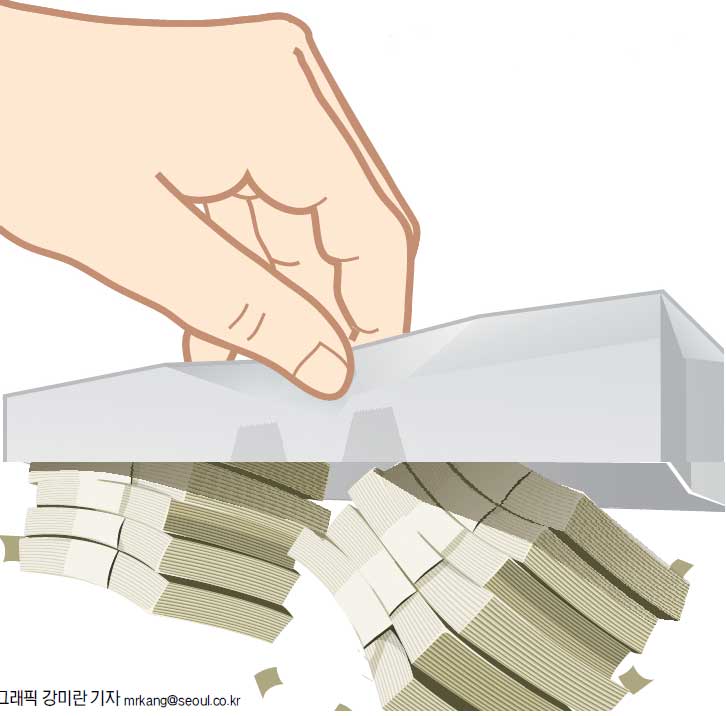
사실 북유럽의 경우 다른 유럽에 비해 소득세 수입이 많고 사회보험재원은 대부분 조세로 부담하며 민간 비중은 낮다. 높은 조세부담으로 인해 경제가 경직되고 과도한 복지로 한계를 맞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직격탄이었다. 하지만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복지 재정을 건전하게 하도록 개혁을 단행했다.
독일은 실업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섰다. 파견근로나 미니잡이 등장했고,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한편 연금수령 연령도 높였다.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고 성장을 통해 복지를 높인다는 선순환 개념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법정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있도록 유도한다. 공공지출 조세부담을 다소 줄였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기도 했다.
이들이 맞닥트렸던 실업증가, 고령화, 세계화 등은 이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하는 과제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북유럽이 기존 복지를 고수하는 대신 세계화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 효용성을 끊임없이 고민한 것은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