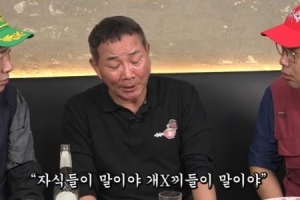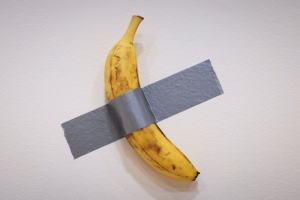한일 강제 병합조약 100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지식인 각각 100명이 10일 공동으로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한 병합조약 원천 불법 무효 선언은 양국 간 관계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날 성명서는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기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대한제국)을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한 한일병합조약이 강압과 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폭거였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나아가 1910년 8월29일에 병합조약이 체결되는 발판을 마련한,그 이전 두 나라 사이의 많은 조약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다.
따라서 언뜻 보면 이날 양국 지식인의 공동 발표는 이처럼 엄연한 ’사실(史實)‘을 새삼스럽게 재확인한 데 지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양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대거 참여한,이번과 같은 규모의 공동 선언이 나온 전례가 없는 데다,그 내용이 한·일 두 나라 과거사와 양국 간의 미래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본 근대사가인 박환무 한양대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번 공동선언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국주의 시대 권력정치에 대한 역사의 복수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적극 평가했다.
기존에 널리 통용되는 ’일제‘라는 말 대신 ’제국주의 시대 권력정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에 의하면,한일병합조약으로 대표되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에 가한 폭력이 후세에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양국 시민사회가 주도했다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결같이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양국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나섰다는 것은 향후 양국 관계에서 진정한 선린우호를 다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선언을 주도한 한국측 지식인들도 이번 일이 “한·일 간의 역사적 화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이해 제국주의시대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는 일본 지식인 사회는 미묘한 변화가 관찰된다.
기존에 일본의 전쟁책임론에서 서서히 벗어나,식민지 지배 체제 전반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번 한일 공동선언의 일본측 선봉 역할을 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동선언은 이런 흐름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만,이번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책임만을 거론하면서,조선(대한제국)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선언 한국 측 지식인 참가자 중에는 광포한 일본 제국주의가 선량한 조선을 침탈하고 무단으로 식민지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음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던 조선은 그 싹이 잘리고 말았다는 식으로 한국역사를 이해하는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병합이 불법,탈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병합조약에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언급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일병합 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國民)‘이라는 관념 자체가 극히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만 형성돼 있었을 뿐이며,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중‘ 상당수는 그들 자신이 ’국민‘이라는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그 자신 계몽 지식인을 자처했다가 조선이 망하자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한 박은식(朴殷植)이 이미 ’한국통사‘(1915)에서 명확히 지적했다.
박은식은 “한국은 단지 군주의 권한만이 있고 소위 민권(民權)이 없는 까닭에 한국에 대한 요구도 단지 임금 한 사람만 협박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군주의 권한을 상실할까봐 고종은 본디 탐권(貪權)·민권 두 글자를 오래전부터 깊이 꺼렸으니…일본이 후일 늑약(勒約)을 순조롭게 성공하게 된 처지가 되었다”고 갈파했다.
모든 권력을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민권을 키우지 않은 까닭에 대한제국은 그 권력을 오로지 틀어쥔 한 사람(고종황제)만 협박하는 것만으로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고종황제가 한일보호조약 등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그 권력을 국민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독점하는 바람에 조선은 쉽사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날 성명서는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기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대한제국)을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한 한일병합조약이 강압과 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폭거였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나아가 1910년 8월29일에 병합조약이 체결되는 발판을 마련한,그 이전 두 나라 사이의 많은 조약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다.
따라서 언뜻 보면 이날 양국 지식인의 공동 발표는 이처럼 엄연한 ’사실(史實)‘을 새삼스럽게 재확인한 데 지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양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대거 참여한,이번과 같은 규모의 공동 선언이 나온 전례가 없는 데다,그 내용이 한·일 두 나라 과거사와 양국 간의 미래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본 근대사가인 박환무 한양대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번 공동선언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국주의 시대 권력정치에 대한 역사의 복수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적극 평가했다.
기존에 널리 통용되는 ’일제‘라는 말 대신 ’제국주의 시대 권력정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에 의하면,한일병합조약으로 대표되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에 가한 폭력이 후세에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양국 시민사회가 주도했다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결같이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양국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나섰다는 것은 향후 양국 관계에서 진정한 선린우호를 다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선언을 주도한 한국측 지식인들도 이번 일이 “한·일 간의 역사적 화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이해 제국주의시대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는 일본 지식인 사회는 미묘한 변화가 관찰된다.
기존에 일본의 전쟁책임론에서 서서히 벗어나,식민지 지배 체제 전반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번 한일 공동선언의 일본측 선봉 역할을 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동선언은 이런 흐름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만,이번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책임만을 거론하면서,조선(대한제국)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선언 한국 측 지식인 참가자 중에는 광포한 일본 제국주의가 선량한 조선을 침탈하고 무단으로 식민지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음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던 조선은 그 싹이 잘리고 말았다는 식으로 한국역사를 이해하는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병합이 불법,탈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병합조약에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언급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일병합 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國民)‘이라는 관념 자체가 극히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만 형성돼 있었을 뿐이며,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중‘ 상당수는 그들 자신이 ’국민‘이라는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그 자신 계몽 지식인을 자처했다가 조선이 망하자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한 박은식(朴殷植)이 이미 ’한국통사‘(1915)에서 명확히 지적했다.
박은식은 “한국은 단지 군주의 권한만이 있고 소위 민권(民權)이 없는 까닭에 한국에 대한 요구도 단지 임금 한 사람만 협박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군주의 권한을 상실할까봐 고종은 본디 탐권(貪權)·민권 두 글자를 오래전부터 깊이 꺼렸으니…일본이 후일 늑약(勒約)을 순조롭게 성공하게 된 처지가 되었다”고 갈파했다.
모든 권력을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민권을 키우지 않은 까닭에 대한제국은 그 권력을 오로지 틀어쥔 한 사람(고종황제)만 협박하는 것만으로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고종황제가 한일보호조약 등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그 권력을 국민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독점하는 바람에 조선은 쉽사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