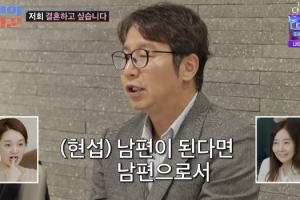북미정상회담 목전 등 중대 국면서 대응도 ‘속도감’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엇박자’ 메시지를 신속히 바로잡는 등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일거수일투족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뒤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체 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은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남북문제를 두고 “유리그릇 다루듯 하라”고 한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잘 드러난 최근 사례는 ‘주한미군 지속 주둔’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보가 정부 당국자가 아닌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주장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물론 있다. 그러나 직책과 무관하게 이런 발언은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온 한미 동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읽힌다.
이번 달 북미정상회담 때 비핵화 빅딜을 기대하는 시기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한미 동맹 지탱은 2인3각 같은 조심성과 신중함을 한층 더 요구한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결국 문 특보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던 상황도 신속히 수습하는 분위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기조발제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될 것이고 여기에 정전협정에 참여했고 한미동맹을 가진 미국과, 또 정전협정의 다른 참여국인 중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논의에 미국과 중국 모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 조 장관의 발언은 하루 전 청와대에서 밝힌 입장과는 다소 달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3일 참고자료를 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 중국의 의사에 따라 3자 또는 4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 혼선을 빠르게 정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때부터 우리는 중국의 지지와 참여를 환영해 왔다”며 “(종전선언·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는 문제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