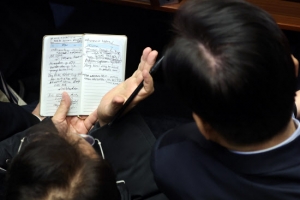英 48만여명 사망원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사람은 왜 죽는가’
‘빅데이터’의 시대다. 정보기술(IT)은 물론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앞다퉈 빅데이터를 말한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석은 찾기 힘들다. ‘빅데이터 혁명’의 저자인 권대석 클루닉스 대표는 “과거에는 저장되지 않았거나 저장되더라도 분석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라며 “빅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판단의 방법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기술이라면 종이의 등장, 인쇄술의 발달, 컴퓨터의 출현, 항생제의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권 대표는 “빅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해해서 할 일을 결정한다거나, 자신의 신념과 감으로 결정을 내리는 인간 본성의 반대편에 있는 기술”이라며 “데이터 분석 노하우와 축적 방법을 바꾸고 있는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미래를 추측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빅데이터의 효용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 같은 자료가 수십년간 쌓인다면 새롭게 투입된 예산이나 연구,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시스템을 마치 인터넷쇼핑몰의 실시간 매출 동향처럼 살피고, 누구나 쉽게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