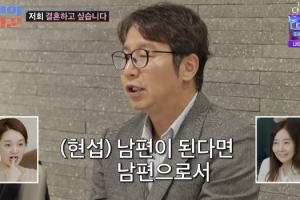화석이 알려준 곤충 겹눈의 비밀

스웨덴 룬드대 제공

각다귀 화석의 머리 부분을 확대해 보면 5400만년 전에도 홑눈이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겹눈의 크기는 1.25㎜ 정도로 파악됐다.
스웨덴 룬드대 제공
스웨덴 룬드대 제공

스웨덴 룬드대 제공

덴마크에서 발굴된 5400만년 전 각다귀 화석.
스웨덴 룬드대 제공
스웨덴 룬드대 제공
움직임과 형태, 색을 감지하는 눈은 다른 신체장기와 달리 구조가 정밀해 생물학자와 창조론자들 모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구상 생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절지동물의 겹눈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룬드대, 스웨덴 국립 화학·재료과학연구소, 웁살라대 진화박물관, 일본 후지타보건대 화학과, 덴마크 살링박물관, 모스박물관, 미국 뉴욕 버팔로주립대 공동연구팀은 각다귀 화석을 분석해 겹눈의 비밀 일부를 풀어내고 그 결과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15일자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겹눈의 기능과 진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각다귀는 다리가 길고 몸이 가늘어 모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이 훨씬 길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 파리목(目)의 곤충이다. 각다귀는 다른 절지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홑눈들이 벌집처럼 모인 겹눈을 갖고 있다. 과학자들은 겹눈의 등장은 삼엽충이 살았던 5억 2000만년 전 초기 캄브리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키틴 각막은 살아 있을 때도 눈이 석회화됐다는 사실 처음으로 보여 준 것”
일반적으로 멸종된 절지동물의 시각적 능력과 눈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석을 분석한다. 그러나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 원래 특징과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종(種)과 비교한다.
연구팀은 겹눈의 형태가 잘 보존돼 있는 5400만년 전 각다귀 화석의 눈과 현재 각다귀의 눈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화석과 현대 표본 모두에서 빛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유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이 검출됐으며 겹눈 가장 바깥쪽은 키틴 성분으로 얇게 덮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키틴 성분의 각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 있을 때도 눈의 일부가 석회화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삼엽충의 겹눈 분석을 통해 곤충 눈의 진화를 연구해 온 고생물학자들은 곤충 화석의 눈에서 키틴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죽은 뒤 화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석회화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해 왔다.
●“눈은 다른 부위와 달리 5400만년 전 진화 완료”
요한 린드그렌 스웨덴 룬드대 지질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절지동물의 경우 눈 구조는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달리 5400만년 전 이미 진화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절지동물의 눈 구조가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삼엽충 같은 과거 절지동물의 안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9-08-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