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4월 카드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묻지 마 카드 발급이 도를 넘어서자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제한하고 길거리 카드 회원 모집을 금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카드사 실질 연체율이 35%를 넘었고 1년 사이 신용불량자가 69만명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른바 ‘카드 대란’이 터졌다.
#2. A저축은행은 몇 년 전 부실 저축은행을 강제로 떠맡았다. 정부와 금감원이 번갈아 불러서 인수를 강요했다. 결국 이 저축은행은 수천억원을 들여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았다. 정부가 약속한 당근은 나중에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다 정치적인 고려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이 엄격한 검사로 부실을 적발해도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맞지 않으면 묻혀 버리기 일쑤인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 감독’을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금감원 국장 출신의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겉보기엔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취약한 조직”이라면서 “윗선(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잘못되면 책임은 혼자 뒤집어쓴다.”고 말했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10~20명 안팎의 위원회 형태로 운영됐던 반면, 현재 금융위는 200여명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정책을 만드는 ‘머리’가 커지다 보니 ‘손발’ 격인 금감원의 종속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 감독 체계에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감독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브레이크)과 금융 정책 기능(액셀러레이터)을 동시에 가진 괴물 조직으로 군림하면서 금감원은 실무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아 줄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 A저축은행은 몇 년 전 부실 저축은행을 강제로 떠맡았다. 정부와 금감원이 번갈아 불러서 인수를 강요했다. 결국 이 저축은행은 수천억원을 들여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았다. 정부가 약속한 당근은 나중에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다 정치적인 고려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이 엄격한 검사로 부실을 적발해도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맞지 않으면 묻혀 버리기 일쑤인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 감독’을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금감원 국장 출신의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겉보기엔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취약한 조직”이라면서 “윗선(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잘못되면 책임은 혼자 뒤집어쓴다.”고 말했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10~20명 안팎의 위원회 형태로 운영됐던 반면, 현재 금융위는 200여명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정책을 만드는 ‘머리’가 커지다 보니 ‘손발’ 격인 금감원의 종속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 감독 체계에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감독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브레이크)과 금융 정책 기능(액셀러레이터)을 동시에 가진 괴물 조직으로 군림하면서 금감원은 실무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아 줄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5-24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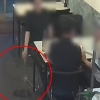











![21대 국회 ‘아니면 말고 식 입법’… 의원 법안 10개 중 7개 폐기·철회[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24/SSC_20240624010419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