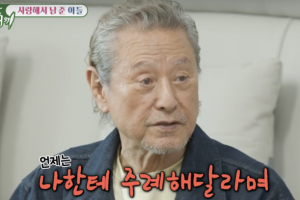호흡기 연구에 많이 쓰이는 생쥐실험 대체 가능성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아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과 공동연구팀은 국내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해 섬모상피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섬모는 포유류는 기관지 안쪽 표면, 양서류는 피부나 세포 표면에 돋아있는 기관으로 섬모상피세포는 비강, 후두, 기관지 등 표면에서 유래한 세포를 말한다.
유럽연합(UN)은 2010년 실험동물보호지침을 만들어 동물실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미국도 2035년부터 의학 및 생물학 실험에서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실험대상 동물을 세포나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로 대체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아 섬모가 독성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데 착안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3월부터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과불화옥탄술폰산, 아황산가스 호흡기독성물질 4종을 형광입자로 처리한 뒤 무당개구리 섬모에서 분리한 섬모상피세포가 형광입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세포 독성 민감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무당개구리 섬모상피세포는 호흡기 독성물질 4종에 대한 민감도가 약 1.7~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민감도는 사람의 구강세포에서 반응과 비슷해 호흡기 질환 연구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이번 연구는 대기오염물질로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연구에 많이 쓰이는 설치류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