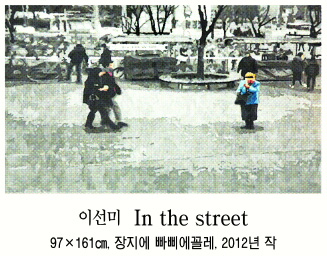

미안해요, 어머니
나는 김치가 그립지 않아요
그 아리고 매운맛을 벌써 잊어버렸나 봐요
나의 혀는 이미 창녀가 다 되어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네요
진종일 한마디도 써본 적이 없는 모국어와
외로움에 굶주린 창자는
결국 홀로 꿈틀거리던 혀를 마비시켰나 봐요
무엇이건 들어오는 대로 씹고 삼키려 하네요
당신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밤마다 세고 그리워하다가
서걱이는 이국종 햇살에 길이 들고
몸뚱이는 바람 든 무우처럼 윙윙거릴 뿐이네요
2012-03-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