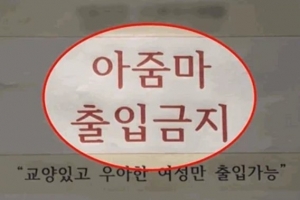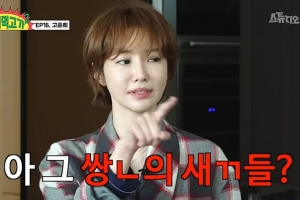‘라임병’에 걸린 어른들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
10대 소년 스콧은 어릴 적부터 친구인 애드리아나를 좋아한다.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순진한 소년에게, 선배가 취향인 소녀는 버거운 상대다. 스콧의 아빠인 미키(알렉 볼드윈·오른쪽)는 냉랭한 아내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곳에서 푸는 남자다. 그는 애드리아나의 엄마 멜리사(신시아 닉슨·왼쪽)와 종종 밀회를 즐기는데, 그의 아내와 그녀의 남편은 물론 두 아이도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 전쟁터에 나갔던 스콧의 형 지미가 잠시 귀향해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지만, 두 집안에 스민 눅눅한 기운은 가시질 않는다. 그 와중에 성인식을 맞이한 스코트는 어엿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임라이프’는 1970년대의 끝자락인 1979년, 1980년 즈음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1979년은 마이클 치미노의 ‘디어 헌터’가 미국 아카데미상을 휩쓴 해다. ‘디어 헌터’는 베트남전 참전 전후로 사슴 사냥을 떠난 젊은이들을 통해 ‘신성한 제의, 순수한 시간, 우아한 전통, 신화적 이상’을 그린 시대의 만가다. 포스트 베트남전 시기의 미국을 다룬 ‘라임라이프’ 또한 사슴 사냥을 끌어온다. 그러나 ‘라임라이프’의 사슴 사냥에는 이상적인 의미가 없다. 제목의 ‘라임’은 사슴 진드기로부터 옮는 질병이다. 감독 데릭 마티니는 미국을 병든 삶이 이끄는 나라로 규정한다.
라임병에 걸려 집과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애드리아나의 아빠 찰리는 그 시대를 대표한다. 나머지 어른들도 속이 곪은 건 마찬가지다. 자유, 사랑, 혁명을 노래하며 1960년대를 통과했으나 시대의 패잔병으로 남은 그들은 아이들에게 역할 모델로 나서지 못한다. 가족 안에 파묻혀 시야를 넓히지 못하는 엄마는 신경증에 걸려 있고, 개인의 안락한 삶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아빠는 돈벌이에 성공해 앞지르기만을 원한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힘겨운 현실을 돌파한다고 주장할 게다. 하지만 그들의 어긋난 몸동작이 거듭될수록 가족과 인간의 연결선이 지워질 뿐이다.
병든 자들이 지배하는 시간의 희생자는 아이들이다.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들은 유사 영웅을 찾아 헤맨다. 나약한 소년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형이 힘센 영웅인 줄 착각하고, 어른에게 환멸을 느낀 소녀는 어른 흉내를 내는 남자 아이에게서 위안을 구한다. 그러나 가짜 영웅의 가면을 벗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다. 형은 아버지의 폭력에 쉬 무너지며, 불량소년은 얄팍한 정체를 곧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제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린다. 성장영화로서 ‘라임라이프’의 맛은 알싸하다.
스콧이 거울 앞에 서서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처럼 구는 장면을 보자(‘택시 드라이버’를 연출한 마틴 스코세이지가 ‘라임라이프’를 제작했다). 감독은 시대의 불순함과 안타까움, 무력함을 그렇게 표현한다. ‘라임라이프’에 계속 삽입되는 예쁘고 단아한 ‘미니어처’ 장면은 잃어버린 이상향처럼 보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의 1980년대도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던가.
같은 시대와 비슷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라임라이프’는 이안의 ‘아이스 스톰’과 비교해 읽을 만한 작품이다. 신인 감독의 연출력을 이안의 그것에 댈 바는 아니지만, 마티니가 사랑스러운 연기 앙상블을 구사했음은 분명하다.
영화평론가
2010-08-3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