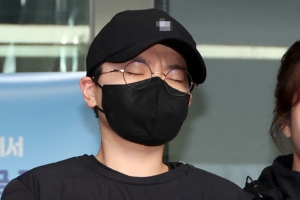아서 쾨슬러 ‘한낮의 어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작품 ‘수용소 군도’는 옛 소련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작품 때문에 반역죄로 추방돼 20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지만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냉전 문학’으로 치부되며 국내에서 제 대접을 받지 못했다.헝가리 출신의 영국 작가 아서 쾨슬러(1905~83)의 ‘한낮의 어둠’(후마니타스 펴냄) 또한 주제나, 작품 평가에 있어 비슷한 처지였다. 스탈린 치하 옛 소련 체제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 ‘반공 소설’이다. 1940년에 쓰였으니 작가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냉전 시대에 무던히도 다른 평가 속에서 읽혀왔다. 하지만 웬일인지 국내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반공 정권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말이다. 1981년 시인 최승자가 번역해 소개되기도 했으나 주목받지 못한 채 절판되고 말았다. 사회과학 전문출판사 후마니타스 ‘문학시리즈’의 첫 번째로 선택된 작품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소설 속 주인공 루바쇼프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역이다. 40여 년 동안 혁명 완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다. 당 중앙위원, 혁명군 사령관 등을 지낸 정치국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 체포돼 혹독한 신문 끝에 처형되고 만다.
루바쇼프는 훈훈한 낭만주의 혁명가였다. 혁명의 시절, 동지들과 함께 원칙과 대의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혁명이 완수된 뒤 그에게 개인은 없었다. 오로지 열정적인 혁명 조국의 완수와 영도세력으로서 당만이 존재했다. 그런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반혁명 혐의를 받고 자신의 오랜 혁명 동지(이바노프)와, 혁명이 낳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빼닮은 새 세대 혁명원칙주의자 글레트킨으로부터 모진 신문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다. 결국 루바쇼프는 이들의 설득과 협박 속에 거짓으로 자백하고 만다. 당의 명령에 순응하며, 스탈린 체제에 마지막 충성을 바치기 위한 방법이 ‘당의 노선에 반대했다.’라고 스스로 조국의 반역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그곳의 인물들이 품고 있는 지독한 이율배반의 모습이다.
이렇듯 비정한 공산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건만 왜 국내에서는 관심을 끌지 못했을까. 표면적으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세웠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비열한 속성, 노동무산계급(혹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혁명과 그속에서 신음하는 대중의 모순적 양상,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억눌러서 이뤄지는 전체주의적 국가 등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9-2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