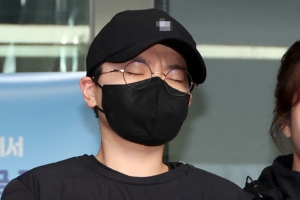저렴한 비용에 지방학생들 몰려 경쟁률 급등
서울에 있는 지자체 장학숙과 대학 기숙사 입사 경쟁이 대학입시 만큼이나 치열해지고 있다. 비싼 ‘대학 물가’ 탓에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지만 수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장학숙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에 건립한 기숙사. 대학 기숙사보다 저렴하고 식당, 독서실,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지방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사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다.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 이용료가 11만~15만원으로 대학 기숙사비의 4분의1~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지도도 철저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선호한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최상위권이고 가정형편도 고려해야 한다. 일류대에 합격하고도 장학숙 입사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학숙 입사가 치열한 대학입시에 이은 ‘제2의 바늘구멍 들어가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북도가 서울 방배동에 세운 ‘전북장학숙’은 올해 108명 모집에 544명이 몰려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사 인원을 시·군별로 할당하기 때문에 전주 출신 학생들은 15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것도 성적 50%, 가정형편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고대 인기학과 합격자가 아니면 지원하기도 힘들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풍남학사’는 90명 모집에 272명이 지원했다. 수능 성적 60%, 가정형편 점수 40%를 적용했지만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인기학과 합격생들이 차지했다.
경기 화성시가 운영 중인 ‘장학관’도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75명 모집에 300여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대1을 기록했다.
화성 향남읍에 사는 서혜진(22·상명여대 4년)씨는 “자취를 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 지난해 장학관에 입실했다.”며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 등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기숙사보다 오히려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대학 기숙사 입사 경쟁도 치열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소재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민자기숙사를 도입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이 20%를 넘는 대학은 없다. 건국대 14.9%, 서강대 13.1%, 서울대 12.1% 수준이다. 성균관대는 7.4%, 숙명여대는 6.3%에 불과하다. 지방출신 학생 비율이 50%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도 대학별로 수백명씩이 기숙사 추첨 또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강대는 664명 모집에 1254명, 건국대는 900여명 모집에 1300여명이 지원해 400~500명씩 탈락했다. 특히 민자기숙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이 통학거리를 일부 전형요소로만 포함시키고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져 서울 학생들도 대거 입주했다. 그만큼 지방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기회가 줄어들면서 불만도 높아졌다.
전주 임송학 서울 박건형기자 shlim@seoul.co.kr
2010-02-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