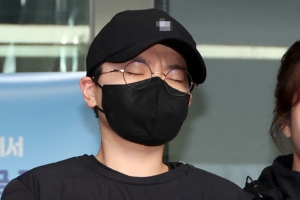회사원 김모(29)씨는 최근 집으로 배달된 교통신호 위반 통지서에 적힌 범칙금을 내려고 경찰서에 문의했다가 ‘이상한 답변’을 들었다.
돈을 내지 말고 버티다가 1만원을 보태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내면 벌점 15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괜히 범칙금을 냈다가 혹시 몇 번 더 걸려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까 봐 경찰관의 ‘친절한 조언’대로 과태료 고지서가 올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되고 벌점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대다수 운전자가 악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는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될 때는 바로 범칙금 고지서인 이른바 ‘스티커’를 떼고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에다 최고 50%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사진과 함께 법규 위반 내용이 적힌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서 보름 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에 스티커를 받게 돼 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기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만원을 더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부분 운전자가 범칙금 대신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택한다는 데 있다.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뀌면서 벌점이 사라지는 것은 과태료가 ‘가벼운’ 범죄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칙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조치여서 차량 소유자에게 법규 위반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과태료를 무는 것이 일종의 상식처럼 돼 있다. 물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자체가 정지 또는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1만원을 더 물면서도 과태료를 택하는 이유는 또 있다. 범칙금을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만, 과태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속도ㆍ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1년 동안 2~3번 내면 5%, 4번 이상은 10%나 보험료를 올려받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과태료로 내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ㆍ취소에다 비싸지는 보험료까지 고려해 ‘만원 더 내고 만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탓인지 2008년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20km 초과 속도위반 123만여 건 가운데 범칙금을 낸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호 위반 89만여 건 중 범칙금을 낸 비율은 34%가량 됐다.
제때 성실하게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벌점에 추가 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2005년 무인단속 카메라의 속도위반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려다 운전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손해보험업계도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횟수만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을 핑계로 보험회사 잇속만 챙긴다’는 여론에 밀려 계획을 접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범칙금을 자진납부하면 깎아주기도 하는 만큼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돈을 내지 말고 버티다가 1만원을 보태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내면 벌점 15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괜히 범칙금을 냈다가 혹시 몇 번 더 걸려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까 봐 경찰관의 ‘친절한 조언’대로 과태료 고지서가 올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되고 벌점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대다수 운전자가 악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는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될 때는 바로 범칙금 고지서인 이른바 ‘스티커’를 떼고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에다 최고 50%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사진과 함께 법규 위반 내용이 적힌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서 보름 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에 스티커를 받게 돼 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기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만원을 더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부분 운전자가 범칙금 대신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택한다는 데 있다.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뀌면서 벌점이 사라지는 것은 과태료가 ‘가벼운’ 범죄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칙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조치여서 차량 소유자에게 법규 위반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과태료를 무는 것이 일종의 상식처럼 돼 있다. 물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자체가 정지 또는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1만원을 더 물면서도 과태료를 택하는 이유는 또 있다. 범칙금을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만, 과태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속도ㆍ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1년 동안 2~3번 내면 5%, 4번 이상은 10%나 보험료를 올려받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과태료로 내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ㆍ취소에다 비싸지는 보험료까지 고려해 ‘만원 더 내고 만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탓인지 2008년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20km 초과 속도위반 123만여 건 가운데 범칙금을 낸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호 위반 89만여 건 중 범칙금을 낸 비율은 34%가량 됐다.
제때 성실하게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벌점에 추가 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2005년 무인단속 카메라의 속도위반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려다 운전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손해보험업계도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횟수만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을 핑계로 보험회사 잇속만 챙긴다’는 여론에 밀려 계획을 접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범칙금을 자진납부하면 깎아주기도 하는 만큼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