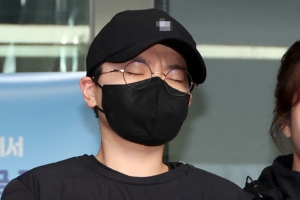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스키 여왕’ 린제이 본(미국)이 정강이 부상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본은 11일 인터뷰에서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던 중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를 다쳤다. 회전을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서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본의 고백으로 여자 알파인스키에 걸린 금메달 5개의 향방은 순식간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본은 이번 대회에서 적어도 3개, 많으면 모든 금메달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던 여자 알파인스키의 최강자이기 때문이다.
본은 “경기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즌을 접긴 싫다”며 X-레이 검사까지 거부한 채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경기에 나서더라도 최고의 기량을 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본이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종목의 판도가 확 바뀐 모양새다.
눈과 얼음 위에서 인간 한계 이상의 속도를 내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이처럼 부상이 큰 변수가 된다.
알파인스키의 경우 선수들은 시속 90㎞~14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코스를 활주해 내려가기 때문에 자칫 넘어지면 크게 다치곤 한다.
린제이 본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도 대회를 앞두고 훈련 도중 넘어졌다.
혼자 내려가지도 못해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될 만큼 큰 부상이었다.
본은 부상을 이기고 경기에 나서는 투혼을 보였지만 결국 메달은 따내지 못했다.
얼마 전 동계체전에서는 한국 알파인스키의 간판 정동현(한국체대)이 경기를 치르다 넘어지면서 허벅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 때문에 알파인스키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전 공식 연습을 치러야 하며 상해 방지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한국의 메달밭인 쇼트트랙도 ‘러시안룰렛’이라 불릴 정도로 변수가 많고 위험한 종목이다.
작은 링크를 빠른 속도로 치러야 하는데다 선수끼리 몸싸움도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늘 부상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2006년 토리노 대회 3관왕에 올랐던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성남시청)는 2008년 1월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펜스와 충돌해 무릎뼈가 부서지는 바람에 결국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표선수로 뽑히지 못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이었던 진선유(단국대) 역시 경기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발목 인대를 다친 여파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미국의 간판 아폴로 안톤 오노 역시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다른 선수보다 훨씬 앞서 달리고 있더라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쇼트트랙은 가장 강하거나 빠르다고 이기는 종목이 아니다. 선수 생활을 하며 크게 다친 적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썰매 종목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루지는 가장 위험한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휘슬러 트랙은 순간 최대 속도가 시속 153㎞까지 나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장으로 알려졌다.
48살의 고령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루벤 곤잘레스(아르헨티나)는 “여기서 코너를 돌 때면 말이 머리를 짓밟는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곤잘레스는 “지난 20년 동안 안 부러져 본 곳이 없다. 레이스를 펼칠 때마다 항상 두려웠다”고 루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쌍의 스키에 의존해 100m 내외를 날아야 하는 스키점프 역시 부상을 달고 사는 종목이다.
올해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스키점프 대표팀 선수들은 “넘어지면서 긁히거나 타박상을 입는 일은 다반사다. 그래도 큰 부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운이 좋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밴쿠버=연합뉴스
본은 11일 인터뷰에서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던 중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를 다쳤다. 회전을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서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본의 고백으로 여자 알파인스키에 걸린 금메달 5개의 향방은 순식간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본은 이번 대회에서 적어도 3개, 많으면 모든 금메달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던 여자 알파인스키의 최강자이기 때문이다.
본은 “경기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즌을 접긴 싫다”며 X-레이 검사까지 거부한 채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경기에 나서더라도 최고의 기량을 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본이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종목의 판도가 확 바뀐 모양새다.
눈과 얼음 위에서 인간 한계 이상의 속도를 내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이처럼 부상이 큰 변수가 된다.
알파인스키의 경우 선수들은 시속 90㎞~14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코스를 활주해 내려가기 때문에 자칫 넘어지면 크게 다치곤 한다.
린제이 본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도 대회를 앞두고 훈련 도중 넘어졌다.
혼자 내려가지도 못해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될 만큼 큰 부상이었다.
본은 부상을 이기고 경기에 나서는 투혼을 보였지만 결국 메달은 따내지 못했다.
얼마 전 동계체전에서는 한국 알파인스키의 간판 정동현(한국체대)이 경기를 치르다 넘어지면서 허벅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 때문에 알파인스키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전 공식 연습을 치러야 하며 상해 방지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한국의 메달밭인 쇼트트랙도 ‘러시안룰렛’이라 불릴 정도로 변수가 많고 위험한 종목이다.
작은 링크를 빠른 속도로 치러야 하는데다 선수끼리 몸싸움도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늘 부상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2006년 토리노 대회 3관왕에 올랐던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성남시청)는 2008년 1월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펜스와 충돌해 무릎뼈가 부서지는 바람에 결국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표선수로 뽑히지 못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이었던 진선유(단국대) 역시 경기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발목 인대를 다친 여파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미국의 간판 아폴로 안톤 오노 역시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다른 선수보다 훨씬 앞서 달리고 있더라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쇼트트랙은 가장 강하거나 빠르다고 이기는 종목이 아니다. 선수 생활을 하며 크게 다친 적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썰매 종목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루지는 가장 위험한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휘슬러 트랙은 순간 최대 속도가 시속 153㎞까지 나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장으로 알려졌다.
48살의 고령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루벤 곤잘레스(아르헨티나)는 “여기서 코너를 돌 때면 말이 머리를 짓밟는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곤잘레스는 “지난 20년 동안 안 부러져 본 곳이 없다. 레이스를 펼칠 때마다 항상 두려웠다”고 루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쌍의 스키에 의존해 100m 내외를 날아야 하는 스키점프 역시 부상을 달고 사는 종목이다.
올해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스키점프 대표팀 선수들은 “넘어지면서 긁히거나 타박상을 입는 일은 다반사다. 그래도 큰 부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운이 좋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밴쿠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