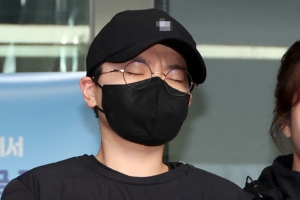이기든 지든 상관없었다. 23일 새벽, 전국은 붉게 타올랐다. 서울 광화문, 부산 해운대, 광주 금남로, 대구 두류공원, 대전 시민공원엔 43만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누가 나오란 적도 없었다. 주도자도 집회허가도 필요 없는 모임이었다. 목적은 그저 단 하나였다. “대~한민국”을 외치기 위해서다.
어스름 여명까지 불길은 죽지 않았다.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는 소리치고 다른 이는 눈물을 흘렸다. 각자의 움직임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가 됐다. 그 소리는 한마음이 돼 바다 건너 한국 선수들에게 전해졌다.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모저스마비다 스타디움을 질주하던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흩어지고 부서졌던 우리는 그 순간 하나가 됐다. 세대도 지역도 이념도 없었다. 함께 환호하고 탄식했다.
60억명의 인류에겐 60억개의 월드컵이 있다. 5000만명의 한국인에게도 5000만개의 월드컵이 있다. 다른 이들이 외치던 목소리와 춤사위를 기억하자. 오늘 새벽, 그들의 방식과 추임새를 존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배려하자. 우리는 각자이면서도 하나다. 그게 월드컵 정신이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어스름 여명까지 불길은 죽지 않았다.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는 소리치고 다른 이는 눈물을 흘렸다. 각자의 움직임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가 됐다. 그 소리는 한마음이 돼 바다 건너 한국 선수들에게 전해졌다.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모저스마비다 스타디움을 질주하던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흩어지고 부서졌던 우리는 그 순간 하나가 됐다. 세대도 지역도 이념도 없었다. 함께 환호하고 탄식했다.
60억명의 인류에겐 60억개의 월드컵이 있다. 5000만명의 한국인에게도 5000만개의 월드컵이 있다. 다른 이들이 외치던 목소리와 춤사위를 기억하자. 오늘 새벽, 그들의 방식과 추임새를 존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배려하자. 우리는 각자이면서도 하나다. 그게 월드컵 정신이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10-06-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