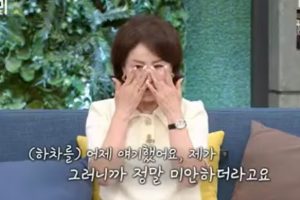“공정성 제고” VS “실효성 없어”
한국판 ‘버핏세’ 논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재원을 늘리고 조세체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더라도 개인소득에 한하고 법인세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세율 높이기보다 세원 넓히기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공정성 갑론을박
인하대 행정학과 윤홍식 교수는 23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찬성했다. 복지재원 확보에 충분하지 않지만, 소득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조세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교수는 “고소득층 증세는 조세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의 의미가 크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를 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1억2천만원 이상의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42%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구간 세율인 45.9%에도 못 미치므로 복지재원 확충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소득에 대한 버핏세 도입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법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법인세도 누진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이전됐을 때에는 누진적 과세가 맞지만, 법인 소득이 법인에만 머무는데 세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강국에서도 법인이득이 개인화됐을 때만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버핏세를 일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로 잘못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는 점이 반박 논리다.
그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버핏세의 취지는 일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낮은 금융소득의 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핏세는 부의 사회환원 효과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다.
그는 “세율이 1%만 높아져도 자본이동이 일어나므로 자본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경우가 많다”며 “부의 사회환원보다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논의의 결과물이 버핏세”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며 “한국 고소득층은 사업소득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들에게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자본 이탈 우려도 쟁점
윤홍식 교수는 버핏세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런 버핏의 문제제기는 근로소득세율과 금융소득세율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취지”라며 “우리는 이를 부자에 대한 증세와 조세 공정성 강화라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버핏세를 통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확충된 재원으로 복지를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한다는 것”이라며 “(버핏세) 도입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비난할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율을 높이면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자본이 이동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세율보다는 임금, 인적자원, 인프라 수준”이라며 “세율을 높인다고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세율을 높이기보다 세원 확대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다”며 “소득 파악률을 높이면 면세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재 연구위원도 “선진국은 적어도 국민의 80%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60% 수준”이라며 “한국은 소득수준보다 면세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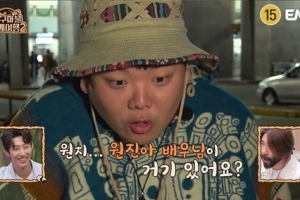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