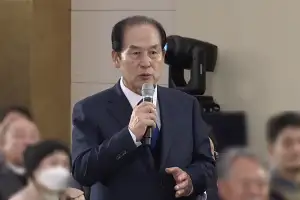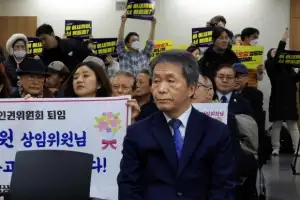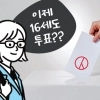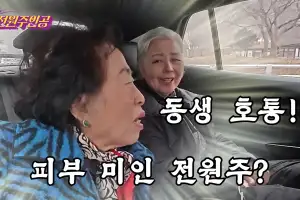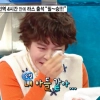오상도 문화부 기자
개인적으론 이도 저도 아니라고 본다. 멍에에 쓸려 생긴 아물지 않는 상처 탓이 아닌가 싶다. 같은 겨레끼리 싸우고 죽였다는 틀에 박힌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전쟁이 진한 상처, 아니 흉터를 남겼다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우리에게 역사적 상처는 비단 한국전쟁뿐만이 아니다. 나치 독일과 달리 이웃 일본은 여태껏 침략과 지배,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남긴 상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상처 치유 활동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군 위안부 문제다.
일본 정부는 그렇다 치고 왜 일본인들은 상식적인 생각의 틀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한국을 찾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금 일본의 청·장년층은 일본이 단지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해선 알고 싶어 하지도, 알려 들지도 않는다”고 고백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브바슈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집단기억’에서 찾으려 했다. 한 민족이나 한 사회집단이 공통으로 겪은 역사적 경험은 그것을 직접 체험한 개개인의 생애를 넘어 집단적으로 보존되고 기억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정체성 확립 과정은 배타성 형성과 동일시된다고 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학살을 경험한 유대인은 이 같은 집단기억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내부적 통합을 이뤘고,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인류 차원의 역사적 집단기억으로 확장했다. 반면 일본 제국주의는 한민족을 우직한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는 데 바빴으나, 정작 패전 후에는 과거의 집단기억에 대한 스스로의 치유 시간을 갖는 데 실패했다. 미국과 옛 소련 간 냉전체제를 교묘히 이용해 ‘영혼 없는 경제적 동물’로 몸집을 불리는 데만 전력한 탓이다.
최근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죄지은 형제들을 남김없이 용서하라”고 진언했다. 잠재된 역사 미화의 본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들의 집단기억을 되돌리는 해법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sdoh@seoul.co.kr
2014-08-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