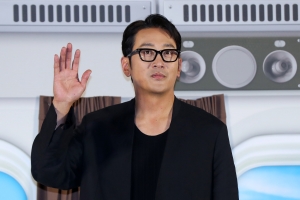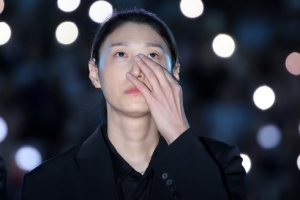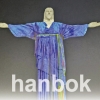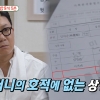지난해 기초행정구역인 읍·면·동을 넘어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741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4.7%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의 통계치다. 2010년에 실시한 인구 총조사(5년마다 실시)에선 1~2인 가구가 전체의 48.2%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1인 가구가 9.6%, 2인 가구는 2.5%였다. 200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철새 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섰지만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몰라 ‘까막눈 투표’가 될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사가 잦은 도시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이 더하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의회의 경우 1034곳의 선거구에서 2898명을 뽑지만 선별하기가 무척 힘들어 애를 먹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본질이 무색하다. 선거 무관심에서 벗어날 방안은 없을까. 지역에 얽힌 사연을 아는 것도 후보자를 고르는 빠른 길이 아닐까.
지역의 숨은 이야기는 가지가지다. 서울의 명칭이 ‘눈 설(雪)+울타리’의 줄임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은 흥미롭다. 조선의 건국을 도운 무학대사가 명당을 찾으러 한양땅에 왔다가 다른 곳과 달리 한곳만 눈이 쌓이지 않아 ‘온기 있는 땅’이라 하여 이곳을 도읍지로 정했다고 한다. 서울이 ‘눈으로 울타리가 처진 곳’이란 뜻이다. 서울 왕십리의 명칭도 무학대사가 만난 노인이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10리를 더 가라”고 말해 지금의 경복궁에 터를 잡았다는 데서 나왔다. 왕십리와 경복궁이 10리 거리이니 그 근거가 와 닿는다. 구로(九老)는 아홉 노인들이 한가로이 살았다 해서, 동작(銅雀)은 구리가 많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중랑(中浪)은 본래 ‘양’(梁)자를 썼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복모음인 ‘양’자 발음을 못 해 명칭을 바꿨다고 한다. 대나무가 많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은 본래 죽일면이었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 이름을 바꾼 경우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우리의 행정 지명은 150여만개에 이른다. 한국땅이름학회의 배우리씨가 했던 ‘남한 토박이 땅이름’ 조사(1989년)에서는 한자 행정 지명의 경우 용산(50곳)이 가장 많았고 신흥(48곳), 신촌(43곳), 금곡(42곳)이 뒤를 이었다. 말(馬)과 관련한 지명이 전국에 744곳이라는 조사도 있다. 지명은 지역민의 삶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2 선거구니 ‘1-가·나’라는 행정 용어가 헷갈리는 지방선거다. 사는 곳의 유래를 찾다 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아지고 후보자의 면면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총 9141억원이 투입된 이번 선거에서 한 표의 소중함을 내 고장의 작은 역사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는 크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섰지만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몰라 ‘까막눈 투표’가 될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사가 잦은 도시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이 더하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의회의 경우 1034곳의 선거구에서 2898명을 뽑지만 선별하기가 무척 힘들어 애를 먹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본질이 무색하다. 선거 무관심에서 벗어날 방안은 없을까. 지역에 얽힌 사연을 아는 것도 후보자를 고르는 빠른 길이 아닐까.
지역의 숨은 이야기는 가지가지다. 서울의 명칭이 ‘눈 설(雪)+울타리’의 줄임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은 흥미롭다. 조선의 건국을 도운 무학대사가 명당을 찾으러 한양땅에 왔다가 다른 곳과 달리 한곳만 눈이 쌓이지 않아 ‘온기 있는 땅’이라 하여 이곳을 도읍지로 정했다고 한다. 서울이 ‘눈으로 울타리가 처진 곳’이란 뜻이다. 서울 왕십리의 명칭도 무학대사가 만난 노인이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10리를 더 가라”고 말해 지금의 경복궁에 터를 잡았다는 데서 나왔다. 왕십리와 경복궁이 10리 거리이니 그 근거가 와 닿는다. 구로(九老)는 아홉 노인들이 한가로이 살았다 해서, 동작(銅雀)은 구리가 많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중랑(中浪)은 본래 ‘양’(梁)자를 썼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복모음인 ‘양’자 발음을 못 해 명칭을 바꿨다고 한다. 대나무가 많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은 본래 죽일면이었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 이름을 바꾼 경우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우리의 행정 지명은 150여만개에 이른다. 한국땅이름학회의 배우리씨가 했던 ‘남한 토박이 땅이름’ 조사(1989년)에서는 한자 행정 지명의 경우 용산(50곳)이 가장 많았고 신흥(48곳), 신촌(43곳), 금곡(42곳)이 뒤를 이었다. 말(馬)과 관련한 지명이 전국에 744곳이라는 조사도 있다. 지명은 지역민의 삶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2 선거구니 ‘1-가·나’라는 행정 용어가 헷갈리는 지방선거다. 사는 곳의 유래를 찾다 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아지고 후보자의 면면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총 9141억원이 투입된 이번 선거에서 한 표의 소중함을 내 고장의 작은 역사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는 크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6-02 31면